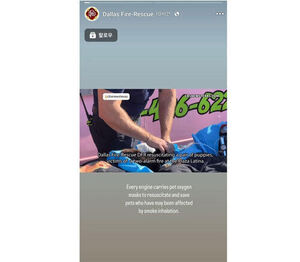배우며 하는 여행 삶의 지평 넓혀 다른 사람처럼 직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 외출도 일주일에 고작 하루이거나 이틀이다. 세상 풍경도 밖에 나가 살피는 경우보다 집 안에서 창밖으로 살필 때가 더 많다. 그런 중에 틈틈이 여러 지자체로부터 ‘길 위의 인문학’ 초청강연자로 초대받을 때가 많다.
 |
| 이순원 소설가 |
그것들이 대관절 이 바쁜 세상에 무에 그리 중요하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어떤 물건이든 사연이든 알기 전과 알고 난 후가 다르다. 그곳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게는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지역적 자긍심을 갖게 하고 일찍이 몰랐던 것을 새롭게 알고 깨달음으로써 자기 삶에 새로운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게 된다.
인문학이라는 것이 직업처럼 책상에 앉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이 마을과 저 마을 사이를 잇는 길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속에, 또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며 겪는 이런저런 일 속에 예전에는 으레 그렇거니 하고 여겼던 것을 지금은 거기에 또 하나의 의미를 넣어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 삶의 즐거운 상상력이다. 그동안은 책 속에만 있는 듯이 보였던 학문이 책 밖으로 나와 길에서든 마을 어디에서든 알고 나면 정말 별것도 아닌 이야기로 새롭게 다가오는 여행의 즐거움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내 평소의 삶으로 돌아와 독서의 장을 넓히고 삶의 경험을 확대하게 한다. 예전에 우리가 쓰던 사투리가 점차 사라지는 게 아쉬워 고향 사람끼리 사투리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인 만남도 갖고, 예전에 쓰던 사투리가 새롭게 생각나면 인터넷 카페에 그 말과 용례를 올리기도 했다. 모아놓으면 자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방언사전이 된다.
얼마 전 원주에 가서 시민들과 함께 이틀 일정으로 ‘길 위의 인문학 여행’을 하고 왔다. 박경리 선생이 ‘토지’를 완간한 단구동의 예전 집필실을 다시 잘 단장해 자료실과 함께 꾸민 박경리문학공원과 토지문화관을 작품과 함께 둘러보는 여행이었다. 뜻밖에 놀랐던 것은 그런 문학공원이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데도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지역주민들은 정작 그곳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었다.
먹고사는 일이 바빠서라지만 때로는 그럴수록 내가 사는 삶의 터전 주변을 둘러보는 여유도 필요하다. 지금도 나는 가까운 사람 누군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거나 수년 넘게 오래 살러 나가면 꼭 ‘토지’ 한 질을 선물한다. 그것은 다만 겉으로 보이는 한 질의 책으로서만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며, 혹은 고국을 떠나며 고향과 고국의 흙 한 줌을 가슴에 안고 가는 것보다 상징적인 일이다.
곧 방학이 다가온다. 지금은 각 지자체마다 걷기 좋은 길을 만들고 그곳으로 사람을 부른다. 예전에는 한 집안의 아버지 혼자 등산을 다녔지만, 이제는 부부가 함께 다니고 또 온 가족이 함께 길을 걷는다. 길을 걷는 것은 자연과의 대화이고 나 자신과의 대화이며 또 함께 그 길을 걷는 가족들과의 대화이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에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 조선시대 문장가 유한준 선생의 말이다. 학문이든 예술이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누릴 수 있다는 뜻인데 어쩌면 여행이야말로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준비 없이 모르고 걸으면 단순한 풍광여행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알고 배우면서 걸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지평을 확대하는 길 위의 인문학인 것이다.
이순원 소설가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멕시코만(灣)을 미국만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747.jpg
)
![[기자가만난세상] 전통예술 생태계 사라지게 둘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09/128/20170709507884.jpg
)
![[삶과문화] 총알은 틀림없이 발사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568.jpg
)
![[맹수진의시네마포커스] 애니멀 킹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6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