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오후 김혜순(61·서울예술대 교수) 시인을 서울 성북구 한 카페에서 만났다. 독하게 죽음과 대면하고 난 뒤 어떤 느낌이었느냐는 질문에 시인이 말한 건 허무하게 반복되는 세상의 ‘리듬’에 관한 것이었다. 소설가 이인성이 주도적으로 꾸리는 ‘문학실험실’에서 첫 단행본으로 최근 펴낸 그의 시집 ‘죽음의 자서전’에는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본 49편의 시가 실렸다. 죽은 이의 혼이 저승으로 떠나기까지 이승에 머문다는 49일을 하루 단위로 쪼개어 죽음을 말하는, 49편의 시가 한편의 시로도 읽히는 시집이다. 지난해 지하철 역에서 쓰러졌던 경험을 토대로 시의 화자가 죽은 자신의 몸에서 나와 혼으로 떠돌며 죽음을 말하는 형식이다. “저 여자는 죽었다. 저녁의 태양처럼 꺼졌다./ 이제 저 여자의 숟가락을 버려도 된다./ 이제 저 여자의 그림자를 접어도 된다./ 이제 저 여자의 신발을 벗겨도 된다.”(‘출근_하루’)로 시작해 “온 세상에 내려앉아서 울며 불며 수런거리며 눈속에 파묻힌 눈사람 같은 네 몸을 찾지 마요, 예쁘게 접은 편지를 펴듯 사랑한다 어쩐다 너를 그리워 마요”(‘마요_마흔아흐레’)로 끝난다.

“시인은 죽음, 소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지요. 시적 감수성이라는 게 일종의 죽음에 대한 선험적 체험 같은 게 아닐까 생각해요. 죽음의 자서전을 내고 나니 깊은 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까지 다녀온 이가 어떤 해방감이나 그 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느낌, 한번 더 눈이 떠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투명하고 밝아진, 현실적으로 말하면 조금 더 관용적인 눈을 뜬 것 같기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다 소멸한다는 것에 대한 관용 말입니다.”
 |
| 자신의 죽음을 상정해 시집으로 묶어낸 김혜순 시인. 그는 “원치 않는 결혼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먼저 죽은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면서 “시 안의 죽음으로 이곳의 죽음이 타격되기를 바랐다”고 ‘시인의 말’에 썼다. |
“시는 현실에서 떠 있는 다른 차원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봐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우리나라 독자 같아요. 그렇게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 예술이라는 게 원래 어려운 거고, 아름다운 걸 원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시의 나라’에는 그 나라의 말이 있고 문법이 있고 그 나라의 세계가 있으니 그 안에도 정서가 있어요. 그림을 볼 때도 조금 알면 입체적으로 더 잘보이거든요. 시도 한국어로 쓴다고 해서 30분 안에 다 독파되는 게 좋은 시집인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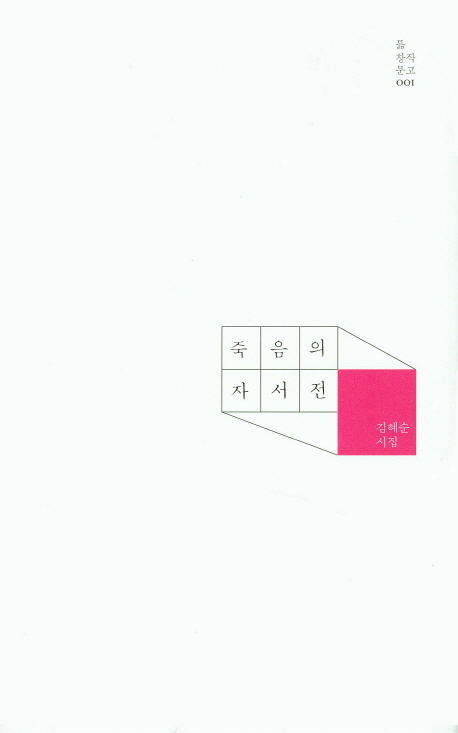
김혜순의 시는 미국에 많이 번역 소개된 편이어서 르빈도 자신의 작품을 접했던 것 같다면서 국내보다 해외에서 오히려 리뷰가 활발하고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혜순의 시집 ‘당신의 첫’ 영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문학 번역상까지 받은 최돈미씨가 시인에게 전해주는 해외 반응이다. 김혜순의 상상력이 처음 보는 것이라거나 미국 현대시가 중단된 어떤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상상력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의 시에서 타자를 대하는 태도가 정치적이라고 평하고 그로테스크한 상상력, 호러영화 보는 느낌, 리드미컬한 언어 사용 등을 지적하는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끊임없이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추구하는 것이야 모든 예술의 숙명이겠지만 김혜순의 경우는 이런 태도에 특히 철저한 편이다.
“시 한 편 한 편마다 몸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인의 몸을 바꾸어야 또 한 편이 나오고 매번 시에 대한 다른 정의를 내려야 되기 때문이죠. 힘든 건 모르겠어요. 저는 시집을 내고 나면 돌아보지 않아요. 평론가들이 제 시를 인용한 걸 보면 낯설어요. 빨리 잊어야죠. 버려야죠. 늘 도망 중인 것 같아요.”
그가 데뷔하던 무렵인 1970년대 후반 출판사에 근무할 때 검열 당국에 자신이 들고 간 저자의 원고들이 빨갛게 지워질 때 그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은 글을 쓰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검열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행간에 자신의 의도를 구부려서 넣으려는 무의식이 그때부터 그의 시의 한 특징으로 굳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에게 ‘도망’은 그러니 많은 것들을 놓아두고 잊어버리고 버려온 시의 행로를 일컫는 상징적인 단어인 셈이다. 내내 데리고 다니던 죽음은 이번 시집에 다 내려놓았다는 시인은 이제 일상적인 유머 코드가 담긴 시들을 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은 옷이 환했다.
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클린턴함·부시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4/128/20250114522930.jpg
)
![[데스크의 눈] 임영웅, 이승환 그리고 김흥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8/22/128/20230822517645.jpg
)
![[오늘의시선] LA산불과 기후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4/128/20250114523943.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가는 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7/128/20241217517750.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