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 낼 수 있는 시대다. 3차원 공간에서조차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사람들은 과학자도 아닌 그가 카이스트에서 뭘 가르쳤냐고 많이 묻는다. 그럴 때마다 아트와 기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 “미술 속에서 기술의 역할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을 벗 삼아 미술표현의 극대화와 다양성 확보라 하겠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이 요즘 미술에서도 핫 이슈다.”
사실 미술은 인류가 태동하던 시기부터 있어 왔다. 미래의 미술 이야기를 하려면 과거의 기술변화에 따른 미술변화가 나침판이 된다. 역사에서 길을 찾는 것이다.
 |
| 김정화 교수는 “인공지능 등으로 인해 점점 더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한 한계가 없어지고 있다”며 “우리 속에 있는 상상력이 예술과 기술, 미래를 함께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
“렘브란트의 작품 348점을 우선 분석했다. 미술사가와 엔지니어 등이 동참해서다. 눈동자는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보고 있는가, 길이와 깊이의 수치는, 붓을 쓴 방법과 간격 등을 2년간 데이터로 만들었다. 컬러와 물감의 두께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연구팀이 딥러닝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
데이터와 똑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다. 하지만 연구팀은 조건을 붙였다. 인물화 중 여자가 아닌 남자, 그리고 여럿이 아닌 혼자 있는 것을 주문했다.
“3D프린터가 열네번의 겹을 쌓아 그림을 완성했다. 그림제목은 ‘넥스트 렘브란트’라 명명했다. 알파고가 이세돌의 바둑 기보를 익혀 승리의 한 수를 일군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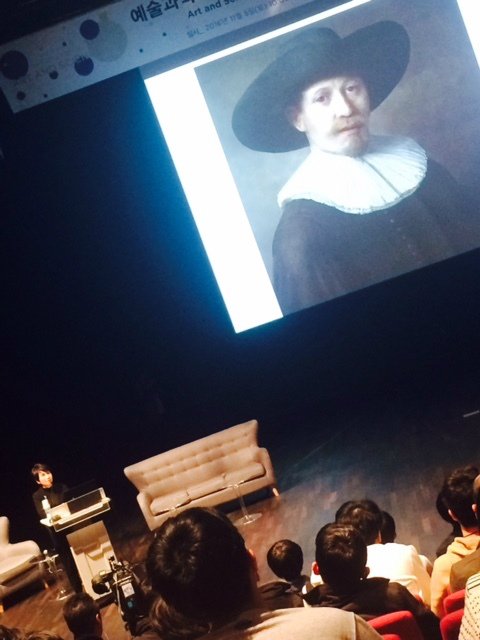 |
| 지난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인공지능시대의 예술+과학’ 특강에 나선 김정화 교수. |
“사실 스타일이 비슷한 것은 찾거나 그리기는 쉽다. 그러나 실제로 그 작가의 생각처럼 뽑아내는 것, 그래서 이 그림을 처음 본 사람들은 ‘아 이제껏 우리가 몰랐던 작가의 그림이 어디서 발굴됐나?’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이 작품을 평론가에게 보여주면 그렇다고 할 거야’라고. 그런데 이 작품을 렘브란트에게 보여주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렘브란트는 자신이 혼자서도 금방 해낼 일을 그 머리 좋은 이들이 2년간이나 한무더기가 돼서 괜한 애를 썼다고 했을지도 모른다.” 인간과 인공지능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이다.
최근 부산비엔날레에서 이이남 작가가 선보인 구글의 ‘틸트브러시’도 인공지능기술의 하나다. 평면이 아닌 삼차원 공간에 그림을 그리는 도구다. 양손에 브러시를 쥐고 허공에 그림을 그리게 된다.
“옆에서 허공에 허우적거리며 그림그리는 장면을 구경할 수 있어 재미가 있다. 아트는 이제 혼자 해서 아트가 아니다. 틸트브러시 홈페이지에 가면 많은 작가들이 실제로 작품 한 것을 캡처해서 볼 수 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3D, 가상현실 등이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놓고 있는 것이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뭔가를 바꿔 놓는 거다.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오관의 능력을 간편하게 확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술은 뭘까. 아마도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한 생각일 것이다. 그런데 기술이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게 하고 혹은 볼 수 없던 것들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하고, 혹은 보고 싶었던 상상을 정말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래서 ‘본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들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다.
“예술가들은 ‘본다’고 하는 것과 ‘본 것을 표현한다’는 것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다.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변화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 예술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공지능도 예외가 아니다.”
미술사를 거슬러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유화가 개발되기 이전에 그림은 나무판 위에 템페라기법으로 그렸다. 염료가루를 계란 노른자에 이겨 붙였다. 계란 노른자는 금방 말라 빠르게 그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제한된 환경에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세밀한 표현엔 제약이 따르게 됐다.
다른 방법을 찾은 게 요즘도 사용하는 유화기술이다. 비로소 엄청난 디테일이 가능해졌다. 유화기술은 당대엔 스티브 잡스가 한 일과 같은 것이다.
원근법도 같은 맥락이다. 르네상스 시대에 인간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해석해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멀리 있는 것을 멀리 있다고 이차원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기술이 원근법이었던 것이다.
이런 기술에 대한 욕구는 뭘까.
“결국 사람이 하는 동작, 가진 감각, 전달하고자 하는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와 필요라고 할 수 있다.”
주변에 대해 관찰을 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패턴을 찾는 것이 과학의 출발이었다. 우주를 관찰하려 하니 광학기술이 요구됐다.
“갈릴레이가 처음 망원경으로 달을 보고 미술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드로잉 실력으로 달을 그렸다. 만질만질한 달이 아닌 곰보자국을 지닌 달이었다. 많은 작가들의 달 그림에 큰 영향을 줬다.”
“수학자에 의해 4차원 개념이 등장하자 피카소는 하나의 대상을 한곳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본 것을 한번에 표현하는 입체파를 견인했다.”
그는 피카소의 말을 다시 환기시켰다.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난 항상 연구를 한다. 연구란 쳐다보고 분석하고 데이터 뽑고 해석하고 내가 다시 표현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전 과정이다.’ 요즘 작가들이 인공지능을 대하는 자세도 피카소 같아야 한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불문학을 전공한 후 파리4대학에서 미술이론을 전공했다. 방대한 정보자료를 활용해 논문을 쓰면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편완식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정치 지도자와 골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8/128/20241118517069.jpg
)
![[김환기칼럼] 유죄·비호감, 한국 정치 리더십의 추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0/23/128/20231023528358.jpg
)
![[기자가만난세상] 추락한 변호받을 권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8/128/20241118517017.jpg
)
![[박소란의시읽는마음] 백장미의 창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8/128/20241118517058.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