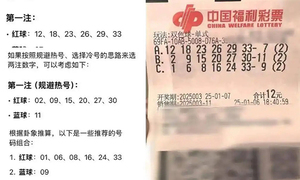각종 웹서비스·스마트폰 앱 등에 쓰여
국내선 美 운영 GPS에 전적으로 의존
장애 발생 땐 ‘서비스 중단’ 위험 우려
3조 이상 투입 위성·지상시스템 박차

◆한국, 2035년 목표로 KPS 개발 추진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KPS 개발사업이 최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본 예타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쯤 발표될 예정이다.
KPS는 우리나라가 한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부속 도서 및 주변 지역에 정밀한 PNT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운영될 예정인 지역위성항법시스템(RNSS·Region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이다.
KPS는 정지궤도 위성 3기와 경사지구동기궤도 위성 4기 등 총 7기로 전체 위성시스템(테스트·예비 1기)을 구성한다. 감시국과 통합운영센터, 위성관제센터, 안테나국 등이 모여 지상 시스템을 이룬다.

지상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에 탑재된 사용자 수신기에서 요구하는 메시지를 생성하고 항법위성에 전달한다. 다수의 항법위성이 지상 시스템의 지시를 받아 다양한 신호를 사용자(수신기)들에게 발송하면 관제시스템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공안전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진다.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지형·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늘고, 고객 위치 데이터를 분석해 마케팅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도 한창인 만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라 할 수 있다.
미국의 GPS나 러시아의 글로나스(GLONASS) 등 초기의 GPS는 미사일을 정확하게 유도하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운용됐다. 당시에는 군사력이 국력의 가장 중요한 척도였지만,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경제력과 기술력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과 맞물리며 GPS 또한 민간 수요에 따라 용도가 확장하고 있다.
KPS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축적해온 우주항공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최첨단 기술이 투입되고, 새로운 기술 또한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11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5만명이 넘는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경제적 효과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항공기나 선박의 사고는 물론 연료 소모를 줄이는 등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 나아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적으로 GPS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GPS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중단 등의 위험에 연쇄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과거 GPS에 의존하던 중국은 “전쟁이 날 경우 미국이 GPS 연결을 끊으면 결정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독자적인 GPS 개발에 나섰다. 실제로 이라크전 당시에도 미국이 GPS 정보 제공을 차단한 바 있다.

◆미래 주도권 놓고 독자 GPS 경쟁 뜨거워
이렇듯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GPS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시장조사업체 얼라이드마켓리서치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LBS) 및 실시간위치시스템(RTLS) 시장은 지난해 289억5000만달러 수준에서 2027년 1838억1000만달러 수준으로 커질 전망이다.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CAGR)이 26.3%에 달한다. 시장조사업체마다 예측 규모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향후 수년간 20%를 웃도는 CAGR 전망치를 내걸 정도로 고성장이 예상된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군사적 목적으로 GPS 개발에 착수했다. 1978년 이를 위한 최초 위성을 쏘아 올렸고 1995년 완성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렇듯 GPS는 과거 미국이 독점했으나 후발주자들의 도전이 거세다. 우선 전 세계를 아우르는 GNSS(Global NSS)를 운영 중인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Galileo(갈릴레오)를 운영 중인 유럽연합(EU), BeiDOU(베이더우)를 운영 중인 중국 등 4개국이다.
미국의 뒤를 쫓아 러시아가 1976년 무렵 글로나스 개발에 나섰고, 1982년 여러 기의 위성을 발사한 뒤 1993년 12기의 위성으로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됐다. 글로나스 구축이 완료된 것은 미국의 GPS와 같은 1995년이다.
중국은 1990년대 개발에 착수한 베이더우의 상업적 활용을 늘리기 위해 2015년 알리바바그룹과 손잡고 관련 기업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2000년 첫 위성을 발사한 이후 고도화를 지속한 결과 올해 6월 마지막 위성 발사에 성공하며 독자 GPS를 보유하기 위한 30년 가까운 대장정을 완수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강대국이 제각각 GPS를 보유함에 따라 EU도 갈릴레오로 대응에 나섰다. 수조원에 이르는 대대적인 예산을 책정했으나, 회원국 간의 분담 및 민간업체와의 주도권 다툼 등이 겹치며 사업 지연이 잇따랐고 고장 및 가동 중단 등 잡음이 빈발했다. 30기의 위성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된 갈릴레오는 현재 26기의 위성이 우주 궤도에서 운행 중이다. 그러나 2기는 테스트용이고, 2기는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실제 운용되는 것은 22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지막 위성을 발사해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은 2025년을 목표로 잡았다.
후발주자인 인도와 일본은 자국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RNSS를 운영 중이다. 인도는 2013년 독자 GPS 나빅(NavIC)을 구축하기 위해 2013년 첫 위성을 발사한 이후 2018년 마지막 7번째 위성을 모두 궤도에 올렸다. 일본도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등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QZSS 개발에 나섰다. 일본은 2017년 4기 위성을 궤도에 올리며 시스템 운용의 최소 요건을 확보했고, 2023년 전체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로써 미국부터 일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둘러싼 4대 강국이 모두 독자적인 GPS를 확보했다. 정부는 KPS 개발을 완수해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정확도 더욱 가다듬는 GPS
삼각측량의 원리를 이용한 GPS는 기본적으로 3기의 위성과 시간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추가 위성까지 최소 4기가 필요하다. GNSS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만큼 위성 수도 30기 안팎에 이른다. 개발 비용만큼 유지 비용도 만만찮다.
글로벌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국가별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분주하다. 중국의 경우 베이더우 1호 시스템(위성 4기)으로 중국 본토 대상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2007년 무렵 2호 시스템(〃 24기)으로 서비스 범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했고, 3호 시스템(〃 35기)을 통해 지구 전체로 범위를 완성했다. 위성 수가 곧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31기 위성으로 운용되는 GPS를 압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나스 또한 2단계에 걸쳐 글로벌 시스템으로 확장했다. 인도와 일본,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서비스 지역이 좁은 RNSS로, 전체 시스템이 10기 미만의 위성으로 구성된다.
각국의 GPS는 민간에 무료 개방되는 일반용과 군사용으로 주로 나뉜다. 일반용은 오차 범위가 수m인 데 비해 군사용은 수㎝ 급으로 정교함의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KPS 또한 GPS와의 조합을 통해 오차 범위를 1m 내외로 줄인 뒤, 향후 2.5∼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GPS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는 ICT(정보통신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단 하나의 GPS를 쓰기보다는 다양한 GPS를 지원하며 서비스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보통이다. 삼성전자가 올해 출시한 갤럭시 노트20과 갤럭시 탭 S7 등의 경우 GPS와 글로나스, 갈릴레오, 베이더우를 지원한다. LG전자의 최신 스마트폰들은 GPS 지원으로 표시돼있다. 애플이 최근 출시한 아이폰12의 경우 GPS와 글로나스, 갈릴레오, 베이더우와 함께 QZSS까지 지원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사우디 왕세자 ‘Mb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500.jpg
)
![[기자가만난세상] 600살 대왕소나무의 죽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395.jpg
)
![[세계와우리] ‘전략적 황금기’ 北… 韓의 준비태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63.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韓 쇼트트랙의 아픔, 린샤오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632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