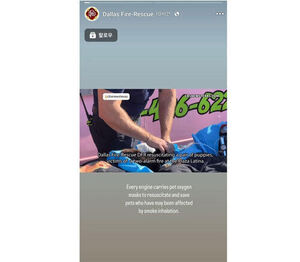미·중 충돌 속 동맹 없이 국익 못 지켜
박근혜정부 외교 참사로 꼽히는 대표적 장면이 2015년 9월 중국 베이징 천안문 망루에 오른 일이다. 서방 국가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나란히 중국 전승절 행사를 지켜봤다. “한반도 안보와 북한 문제에서 중국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게 당시 청와대 설명이었는데 후일 어느 무속인의 ‘통일 예언’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 예언에 따라 ‘통일대박론’을 밀어붙였고 중국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천안문 망루에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정작 어떤 도움도 못 받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혹독했던 보복은 지금도 회복이 어려울 정도다.
문재인정부는 처음부터 중국에 공을 들였다. 핵심 국정 과제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해 중국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은 첫 중국 방문 당시 ‘한국은 작은 나라’ 발언으로 저자세 외교 논란을 불렀다.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美) 미사일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을 않겠다”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3불(不) 천명은 ‘친중 선언‘으로 받아들여졌다. 후임 정의용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중국을 택하고 문 대통령이 최근 미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 주도 보아오포럼에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는 ‘위시풀 싱킹’(wishful thinking·희망적 사고)이다.

외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 신념은 ‘통일대박론’처럼 허망하다. 위시풀 싱킹에 기댄 문정부의 ‘희망 외교’를 단적으로 드러낸 표현은 “(남북, 북·미 문제를)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 일괄 타결할 수 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는 말이었다.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단칼에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어버리듯 원샷 처리할 수 있다는 ‘집단 희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자명하다. 역사적 전환점이라던 남북정상의 판문점선언 3주년은 어제 공식 행사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북·미 회담과 한·미 외교현장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존 볼턴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책(‘그 일이 일어난 방’)에는 곳곳에 “북한은 문재인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모든 회담을 ‘춤판’(fandango)에 비유하고 “아무 실체도 없는 위험한 연출이었다”고 한 그의 평가는 틀리지 않다. 도보다리의 추억, 정상 간 친분 쌓는 동안 북한에는 차곡차곡 핵무기가 쌓였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랜드연구소가 공동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 보유 개수는 연간 12∼18개 늘어나 2027년쯤 최소 151개, 최대 242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과거 핵분열물질 추정 생산량 등에 기반한 관측이라 불확실성이 크지만 중요한 건 북 핵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 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상대해야 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트럼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외교적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를 위해 외교 전선에서 싸워야 하며 세계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리더십이 미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바이든이 트럼프가 실패한 지점에서 대북 협상이 시작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 말에 귀를 기울일까. 중국과 가치 전쟁을 시작한 그가 미·중은 우리가 선택할 대상이 아니라는 문정부를 동맹 파트너로 신뢰할까.
문정부 희망과 달리 냉전 구도는 녹지 않고 그대로인데 동맹만 느슨해지는 결과가 됐다. 북한만 바라보고 우리가 판을 짤 수 있다는 ‘희망 외교’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이다. 청와대는 2019년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미 정부가 부정적으로 반응하자 “아무리 동맹관계여도 국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동맹 없이도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린다. 남들이 곳간에 쌓아놓은 코로나 백신을 우리는 뒤늦게 확보하느라 허둥대고 있다. 기업들은 미·중 전쟁에 반도체, 5G 같은 첨단기술 업계에 불어닥칠 후폭풍을 가늠하느라 전전긍긍한다. 한 달 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게 동맹의 힘이다.
황정미 편집인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8/128/20250108522856.jpg
)
![[세계포럼] 국정 공백 속 책임 내던진 다수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6/30/128/20190630508230.jpg
)
![[세계타워] 실손보험, 사회 안전망 역할 유지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07/128/20240807524904.jpg
)
![[사이언스프리즘] 우리의 뇌는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8/128/2025010851910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