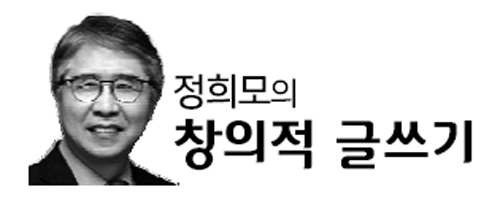
오래전의 일이다. 지방 대학에 계시던 어느 노교수님을 방문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하면 리듬에 맞춰 잘 읽는 학생이 나오는데 그 학생은 틀림없이 글도 잘 쓴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뜸 “교수님, 그렇게 일반화하기란 좀…”이라고 반론을 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좋은 문장은 소리와 연관이 있어 리듬을 타는 학생이 문장을 잘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교수의 생각이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 말은 해명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사실 말하기와 쓰기가 운율 속에서 같았던 시절이 있었다. 우리도 그렇고 서양도 그러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만 보더라도 문자가 아니라 오로지 낭송으로 지어져 후대에 전승된 것이다.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곡 ‘구름’을 보면 학생들은 교실에서 책을 보지 않고 구전적 암송을 반복하는 장면이 나온다. 당시에 주된 교육방식이 시를 암송하고 이를 학습하는 것이었다. 우리도 근대까지 서당에서 사서삼경을 소리 높여 암송을 하면서 외웠다. 이야기는 운율을 실어 암송되었고, 그 암송된 내용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이미지로 환원되어 전달됐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눈으로 보지만 뇌 속에서 청각적 이미지로 바뀐다고 한다. 의사소통에 있어 시각보다는 청각이 더 근원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우리가 글을 고칠 때 소리내어 읽는 것도 문장의 내적 운율 속에 이야기의 울림이 담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독자도 글을 읽을 때 문장 속에 담긴 리듬이나 운율을 통해 글에 담긴 필자의 마음과 내면의 울림을 느낄 수가 있다.
볼테르는 문장을 ‘소리의 그림’이라고 말했다. 글을 쓸 때는 소리에 담긴 운율감이 정말 중요하다. 짧은 문장이나 긴 문장을 반복해서 사용하거나 호흡에 맞춰 문장을 끊어 가면 리듬이 산다. 긴 관형절을 피하고 부사와 서술어를 잘 활용하면 문장에 운율감이 생긴다. 이렇게 문장이 흐름을 타면 읽는 사람도 편안하고 글도 평온해진다. 모름지기 작가라면 글을 쓰고 글을 고칠 때마다 큰소리로 100번을 읽어 리듬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이런 글을 쓰다 보니 갑자기 노교수의 말처럼 문장의 리듬을 아는 사람이라면 글도 잘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공포의 집속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6/25/128/20240625519556.jpg
)
![[데스크의눈] 월마트식 유통혁신 한국은 안 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2/21/128/20230221518847.jpg
)
![[오늘의시선] 꿈틀대는 부동산시장, 필요한 정책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6/25/128/20240625519481.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고향의 선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06/128/2024020651940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