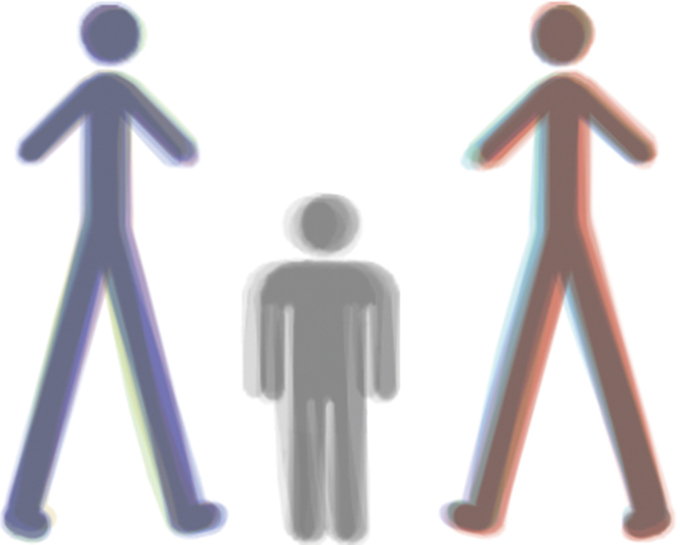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등록 외국인 인구를 더한 등록인구에 통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하루 3시간,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합해 산정한다. 정부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사람들을 정주(定住)시킬 수 없다면 최대한 오래 머물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유연한 전략의 산물이다. 뚜렷한 해답을 찾기 어려운 인구절벽 시대의 고육지책이라고나 할까.
충북 단양군의 등록인구는 약 2만8000명에 불과하다. 과거에는 서울에서 4시간 가까이 걸리는 ‘오지’였지만 2000년대 들어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청풍호 등이 유명해지면서 관광객이 늘어났다. 최근엔 빼어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레저 관광객이 몰려 2030세대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가 됐다. 단양군의 생활인구는 26만9700명으로, 등록인구의 8.6배에 달한다. ‘서핑 성지’ 양양군의 생활인구(7만5300명)도 등록인구(2만7700명)의 두 배 이상이다.
일본은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내세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고향 납세인데, 도시민이 특정 지역의 응원하고 싶은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2년 고향 납세 명목으로 일본 전국의 지방정부가 받은 기부금은 9564억1000만엔(약 8조7900억원)에 이른다. 독일은 한발 더 나아가 복수주소제를 채택했다. 주말부부나 취업 등의 이유로 부주거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행정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다. 2021년 기준 독일 인구의 1.5%인 120만명이 부주소지를 갖고 있다.
저출산 심화로 비수도권 지자체는 대부분 소멸 위험에 처해 있다. 생활인구가 의미있는 건 지자체들이 ‘제로섬 게임’인 등록인구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체류인구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거주인구가 줄어도 생활인구가 많은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그러자 경북 청송군은 생활인구를 늘리려고 “교도소라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저출산, 지역소멸 시대에 살아남으려는 지자체의 몸부림이 씁쓸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尹 정부의 끝없는 무속·역술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3/128/20241223516976.jpg
)
![[기자가만난세상] 당국자 마인드 못 버린 의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02/128/20240202514187.jpg
)
![[채희창칼럼] 수사 시스템 이대론 안 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3/128/20241223516964.jpg
)
![[신병주의역사저널] 연산군이 탄핵된 까닭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2/23/128/20241223516033.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