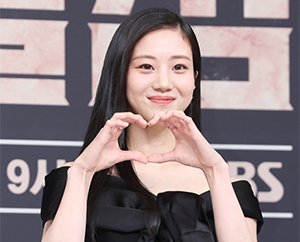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72년 1650만명대(중위 추계)까지 쪼그라드는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2072년 국가채무가 730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저출생·고령화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072년 0.3%로 하락하는 가운데 총지출이 총수입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특히 현재 흑자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경우 2057년과 2042년에 각각 적립금이 소진돼 국가재정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3일 예정처가 발간한 ‘NABO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1270조4000억원(GDP 대비 47.8%)에서 2072년에는 7303조6000억원(GDP 대비 173.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는 정부의 상환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나랏빚으로 불린다.

연도별로 국가채무는 2030년 1623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55.3%를 기록한 뒤 2050년에는 4057조4000억원으로 GDP 대비 비중(107.7%)이 100%를 넘게 된다. 2050년 무렵이 되면 한국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전부 현금화하더라도 국가채무를 갚기 힘든 수준이 되는 셈이다. 국가채무는 이후 2060년 5476조5000억원으로 GDP 대비 136%까지 상승하고 2072년이 되면 7300조원을 넘게 된다. 2025년부터 2072년까지 국가채무 연평균 증가율은 3.8%에 달한다.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2025년 85조5000억원(GDP 대비 –3.2%)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GDP 대비 –6.4%)까지 꾸준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2030년 98조9000억원(GDP 대비 –3.4%)으로 100조원에 육박한 뒤 2040년 156조1000억원(GDP 대비 –4.5%)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2050년 193조6000억원(-5.1%)을 기록한 뒤 2060년에는 226조9000억원(GDP 대비 –5.6%)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뒤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추가로 차감한 것으로, 나라곳간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재정 지표다. 예정처는 “국가채무가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건 관리재정수지가 증가하면서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고채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나랏빚이 이처럼 천정부지로 치솟는 배경엔 저출생·고령화 충격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 등이 늘면서 정부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중위 추계 기준 생산연령인구는 2025년 3591만명(총인구 대비 69.5%)에서 2030년 3417만명(〃 66.6%), 2072년 1658만명(〃 45.8%)으로 급감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한 인구(유소년·고령인구)를 의미하는 총부양비는 2025년 43.9명에서 2058년 100명을 넘어선 뒤 2072년 118.5명 수준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2025년 676조3000억원에서 2072년 1418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1.6% 증가하는 반면 총수입은 같은 기간 650조6000억원에서 93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0.8%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공적연금 등의 수급자 수 증가와 고령화에 다른 복지지출 증가 등 의무지출이 늘면서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25년 25.5%에서 2072년 33.6%로 상승할 전망이다. 예정처는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누적 적립금이 2039년 1936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지출이 더 많은 적자 상태에 돌입해 205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학연금기금 누적 적립금은 이보다 더 빠른 2027년 28조2000억원으로 최고점을 보인 뒤 2028년부터 적자로 전환해 2042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으로 추계했다.
인구 구조 변화는 성장률 하락도 부채질한다. 예정처에 따르면 실질GDP 성장률은 2025년 2.2%에서 2030년 1.9%로 2%를 밑돈다. 이후 2040년 1.2%를 나타낸 뒤 2050년 0.8%로 1% 밑으로 추락, 2060년과 2072년 각각 0.5%, 0.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질GDP 성장률은 노동과 자본, 총요소생산성의 합으로 결정되는데 각 항목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노동 측면을 보면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25년 64.4%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하면서 취업자 수(중위 기준)는 2032년 2908만명에서 2072년 1828만명까지 하락한다. 또 노년부양비가 1%포인트 상승하면 GDP 대비 고정투자 비율이 0.47%포인트 하락하는 등 자본의 생산성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발전 등을 아우르는 총요소생산성 역시 예정처는 “지속적인 혁신 부재 등으로 추세적 하락 패턴을 반복한다”면서 2072년까지 증가율이 연평균 1.0%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다만 중위 추계보다 인구가 덜 줄어든다면 국가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생산연령인구가 2072년 2007만명 정도로만 줄어드는 통계청의 고위 추계가 현실화할 경우 2072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63.2%포인트로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위 추계 국가채무비율(173.0%) 대비 9.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예정처는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잠정)으로 예상돼 2016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이러한 현상이 일시에 그치고 저위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위 수준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마윈의 복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3/128/20250223510434.jpg
)
![[특파원리포트] 케네디센터 코드인사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2/128/20250112515508.jpg
)
![[김정식칼럼] 내수 살리기 총력전 펼쳐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9/128/20250119516487.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멀고 험난한 ‘유종지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2/128/202501125154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