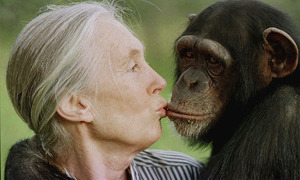◆소프트 파워와 문화 의미체계로 한민족을 다시 읽다
한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늘 새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열망이 살아 있었다. 불교의 미륵신앙, 조선 후기의 예언서 정감록과 격암유록, 그리고 동학과 천도교로 이어진 사상은 시대마다 고난을 견디게 한 힘이자 민족 정체성의 뿌리가 됐다. 이러한 전통과 문화유산은 한민족이 스스로를 이해하고 세계와 관계 맺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정치학자 조셉 나이(Joseph Nye, 2004)의 소프트 파워 개념,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 1912)의 집합의식 개념,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 1973)의 문화 의미체계의 개념을 이론적 틀로 삼아 한민족 전통·문화유산을 들여다보면 어떠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의 전통·문화유산과 민족 정체성 부분을 사회학적·정치학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한민족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 통합, 나아가 국제사회와의 소통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나이의 소프트 파워란 강제력이 아닌 매력을 통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으로, 이 개념을 적용하면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유산, 특히 미륵신앙과 동학·천도교의 평화·정의 사상은 한국 사회가 세계에 제시할 수 있는 매력적 가치로 자리매김함을 알 수 있다.
19세기 동학과 천도교가 보여준 평등, 보국안민, 인내천 사상은 인간 존엄과 평등, 사회 정의를 강조하며 농민운동과 항일운동으로 이어져 국내적으로 사회개혁 운동을 촉발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류 보편적 가치와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었다. 따라서 한민족의 문화유산은 국가 이미지와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소프트 파워의 원천으로 해석할 수 있다.
뒤르켐의 ‘집합의식’ 관점에서도 한민족의 전통·문화유산과 민족 정체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민족의식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도덕적·정신적 토대를 의미한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에서 확인되는 미륵불 신앙은 언젠가 미래에 부처가 다시 나타나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민중에게 고난 속 희망을 준 종교적 전통이다. 또 정감록·격암유록 등 조선 후기의 예언서는 불의한 세상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담아 민중에게 연대감을 부여했다. 동학과 천도교의 교리 역시 사회적 혼란기마다 민족을 하나로 묶는 상징적 자원이 되었다. 무엇보다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사상은 모든 인간이 하늘을 모시는 존재라는 집단적 신념을 제공하여 사회 통합을 촉진했다. 이러한 신앙적 전통은 한민족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공동체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집합의식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문화인류학자 기어츠(1973)의 ‘문화 의미체계’ 개념을 적용하면, 한민족의 전통과 신앙은 상징적 언어로서 민족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즉, 기어츠는 문화를 인간이 세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상징적 체계라고 보았다. 한민족 전통에서 나타나는 미륵불, 성군(聖君, 메시아적 군주)의 예언, 동학의 시천주와 천도교의 인내천은 종교적 상징을 초월해 민족적 세계관을 드러내는 기호체계다.

예를 들어, 미륵불은 고난 속에서 미래 구원의 희망을 상징했고, 정감록은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민중의 해석틀이 되었다. 동학과 천도교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강조하며, 한민족의 역사적 경험을 재해석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문화적 언어를 형성했다. 따라서 이들 전통은 상징적 의미체계로서 민족 정체성을 표현하고 세대 간 전승되는 해석의 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유산은 소프트 파워 관점에서 국가의 매력 자산이자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하고, 집합의식 관점에서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민족적 연대를 강화하는 기제로 기능한다. 또 문화 의미체계 관점에서는 한민족이 세계와 자신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상징적 언어로 이해됨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학자의 관점이 서로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전통과 신앙은 사회적 결속을 넘어 민족이 세계에 발신할 수 있는 힘이 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정신적 기반을 제공하며, 나아가 그 자체로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는 상징적 언어가 된다. 특히 한민족의 전통과 문화유산은 과거를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 한국 사회가 세계와 소통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다층적 자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민족의 전통·문화유산은 ‘국가 전략(소프트 파워)’ ‘사회 통합(집합의식)’ ‘문화 해석(상징체계)’이라는 세 차원을 아우르는 핵심 자원이 된다. 이러한 사회학적·정치학적 해석은 한민족이 지닌 독특한 서사가 오늘날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한국 사회가 위기 속에서도 연대하고, 세계와 소통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은 한민족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민족의 신앙이 오늘날 역사 속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빛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주한 美 7공군 사령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817.jpg
)
![[기자가만난세상] 슬기로운 명절 에티켓](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599.jpg
)
![[세계와우리] 경주 에이펙과 실용외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808.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달을 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02/128/202510025165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