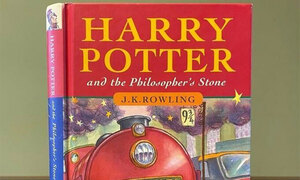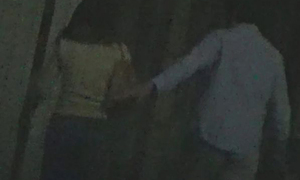생각이 달라도 주변 얘기에 귀 기울여 보자
현대인이 외롭지 않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정말로 외로운 적도 없었다. 고독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얼마 전 맥도날드에서 혼자 점심을 먹었다. 처음에는 뭐가 달라졌는지 선뜻 이해하지 못했다. 음식 소리, 주문 알림, 남은 음식을 버리는 소리 같은 소란함은 여전했다. 조금 지나고 깨달았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주위를 둘러봤다. 온통 한손에는 햄버거, 다른 손에는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연결된 시대를 살아간다. 직장과 학교 등 물리적 사회생활의 일과가 끝나도 시시때때로 단톡방이 울려대고, 소셜미디어에 지인들의 업데이트가 올라온다. 한편에서는 친구와 가족의 다이렉트메시지(DM)가 답장을 요구하고, 받은 편지함의 이메일은 계속 쌓여간다. 이렇게 연결된 삶은 피곤하다. 사회성이라는 에너지는 마치 배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쓰고 나면 방전된다. 이걸 다시 충전해 주는 전원이 바로 ‘고독’이다. 사람들에게 치여서 지쳐가다가도 혼자 남게 되면 다시 외로워져 무리를 찾게 만드는 이 감정이 우리를 사람들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힘인데, 스마트폰은 이 고독을 앗아갔다. 이 과정 속에서 현대인은 다른 사람을 참고 견디는 방법마저 조금씩 잊어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시사지 디애틀랜틱은 ‘반사회적 시대’(the Anti-Social Century)라는 기사에서 스마트폰으로 달라진 인간 관계를 설명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가까운 연결(가족)과 먼 연결(관심사가 유사한 무리)을 강화한 반면, 중간 연결(동네 이웃)은 파괴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스마트폰 덕분에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가족이나 친구처럼 가깝지는 않아도 관심사가 유사한 소셜미디어 속의 무리에게서 더 넓은 세상을 배우고 있다. 반면 이 양 극단에 포함되지 않는 동네 이웃 정도의 거리감을 가진 상대와 만날 필요는 극적으로 사라졌다. 우리는 더 이상 은행이나 동사무소에서 줄을 기다리다 이웃을 마주치지 않고, 배달앱 덕분에 식당과 시장에도 가지 않기 때문이다. 디애틀랜틱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인들은 2003년보다 하루 평균 99분 더 긴 시간을 홀로 집에서 보낸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들은 이 시간을 고독 대신 비슷한 무리의 먼 연결에 소비한다. 이런 먼 연결에 익숙해지면 점점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불편해진다. 미국 전국선거연구조사가 이런 경향을 잘 보여준다. 이 조사는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에게 상대에 대한 호감도 조사를 벌인다. 그 결과 2000년 8%에 불과했던 0점 답변, 즉 상대를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0년에는 40%로 늘어났다. 만약 지난 20년간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대신 직접 얼굴을 마주보며 자녀의 안부를 물어 왔다면 그때도 이렇게 서로의 생각 차이만으로 서로를 싫어하게 됐을까.
땅과 바다, 하늘, 우주에 이은 제5영역을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한다. 이 영역에서는 물리적 세계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혼란이 쉬지 않고 일어난다. 이 혼란을 멈추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시작은 어렵지만은 않다. ‘차단’과 ‘친구삭제’, ‘팔로 취소’ 대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자. 이런 노력이 힘들다면, 적어도 가끔씩 하루이틀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멀리해 보자. 우리에겐 주위 사람들을 다시 소중하게 느끼게 만들 진짜 고독이 필요하다.
김상훈 실버라이닝솔루션즈 대표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페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128/20250212518599.jpg
)
![[세계타워] 불확실성에 사로잡힌 한국 경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29/128/20231129518334.jpg
)
![[세계포럼] 청와대·헌법은 죄가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5/02/128/20210502510137.jpg
)
![[김상훈의 제5영역] 혼자여도 고독하지 않은 사람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2/128/202502125184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