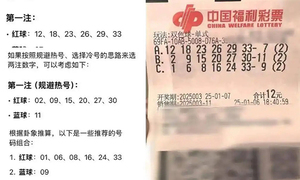사전적 의미에서 초심은 ‘처음에 먹은 마음’을 뜻한다. 그런데 대중예술인(정치인 포함)에게 초심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의 기대를 말한다. 현재형인 성공을 미래형으로 연결하고자 할 때 언급되는 초심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의미한다. 변하지 않겠다는, 혹은 최초의 상태로 다시금 돌아가겠다는 이러한 전략이 대중예술인에게 적합한 것일까. 이를 위해서는 전설의 생애를 살피는 것이 유용하다.
 |
| 전상진 서강대 교수·문화사회학 |
딜런은 21세의 젊은 나이에 ‘바람만이 아는 대답’과 ‘시간은 바뀌고 있다’를 발표하면서 만인의 주목을 끈다. 1966년 오토바이 사고가 있기 전까지 그는 저항적 음유시인으로서 명성을 쌓는다. 딜런과 저항의 강력한 연관성은 사실 그가 가수로서의 이력을 시작하면서 들고 나왔던 음악 장르, 즉 포크 음악에 기인한다. 오늘날 힙합이라는 장르가 그러하듯 포크는 서민, 배제된 자들, 그러니까 아웃사이더의 음악이었다.
사고에 따른 강제적 휴식을 2년 동안 보낸 딜런은 컨트리 뮤직으로 복귀한다. 그런데 포크와 컨트리는 대척점에 선다. 포크가 일종의 반문화의 표상이었다면 컨트리는-적어도 당시의 분위기에서는-반동적인 문화의 상징이었다. 그의 팬에게 이러한 음악적 변신은 감내하기 힘든 것이었다.
그의 변신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1970년대 후반 그는 개신교에 귀의했고, 그 후 몇 년 동안 그의 콘서트는 복음 성가의 무대였다. 1981년 다시 세상으로 귀환했지만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매우 긴 슬럼프를 경험한다.
성공적인 복귀는 얄궂게도 우드스탁 페스티벌이었다. 최초의 우드스탁 페스티벌(1969년)은 저항운동의 음악적 전설이다. 딜런은 많은 이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 자리에 참석지 않았다. 그것은 배반이고 변절이었다. 하지만 두 번째 페스티벌(1994년)에 참석한 그는 과거의 저항가요를 통해 재발견된다. 그렇게 그는 현존하는 음악 성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는 현재까지 세계 투어를 다닌다. 작년에는 한국에, 올해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투어를 개최했다. 그런데 마지막 두 투어가 또 말썽이다. 본인은 부정하지만 관계당국의 검열에 굴복한 혐의가 짙다.
밥 딜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는 팬들의 기대, 달리 말하면 외부의 정체성 규정에 단 한 번도 순응한 적이 없다. 저항가요로 주목을 받았을 때도, 컨트리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도, 저항가요로 다시금 주목을 받았을 때도, 검열에 순응할 때도 그는 외부의 시선에 무감각했다. 그의 초심은 공백이며, 목표는 오로지 그 자신이다. 사회학자 리처드 세넷은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형을 유연한 인간, 즉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인성이 파괴된 인간이라 간파한 바 있다. 딜런의 생애는 유연한 인간의 삶의 전략을 최고의 수준에서 보여준다. 대중예술인들은 그 전략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에게 그것은 너무 버거운 일이 아닐까.
전상진 서강대 교수·문화사회학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젤렌스키는 독재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0/128/20250220522470.jpg
)
![[기자가만난세상] 불편한(?) 지진 재난문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395.jpg
)
![[세계와우리]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1/128/20240321519850.jpg
)
![[강영숙의이매진] 미술관이 학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128/202502065202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