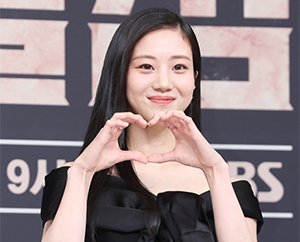“충북에서 지진 발생한 걸 왜 다른 지역까지 보냅니까.”
기상청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하나다. “진원지부터 반경 몇 ㎞까지 재난문자를 보내느냐”, “미국 교포들한테도 보내주냐”는 등 질문의 연속이다. 7일 게재된 이 내용들은 그날 오전 2시35분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규모 3.1의 지진 관련 재난문자 발송을 힐난한 것이다.

새벽잠을 깨운 지진 재난문자에 뿔난 이의 성화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항의 전화도 잇따랐고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들어왔다”며 “곤히 자는 시간이라 불편을 느끼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새벽 재난문자 발송이 ‘어떤 경계선에 있는 문제 같다’고 했다. 이게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 입장에서는 균형감 있는 견해일지 모르나, 사인으로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경계선이라 하면 ‘재난 경보의 시급성’과 ‘수면권’ 사이를 말하는 걸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둘은 ‘체급’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충주 지진이 발생한 오전 2시35분 기상청 조기경보시스템이 자동 추정한 규모는 4.2였고, 예상진도는 지역별로 강원·충북 5, 경기 4, 서울·경북·대전·세종 등 3이었다. 국내 지진 기준으로 규모 4.0 이상, 5.0 미만이면 예상진도가 2 이상인 시·군·구에 ‘삑’ 소리가 나는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된다. 수도권 등에서 충주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를 받은 건 이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3분 뒤인 오전 2시38분 기상청은 상세 분석을 거쳐 확인한 지진 규모 3.1 등 정보를 일반 알림이 울리는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송출했다.
최초 자동 추정값과 상세 분석값 간 차이를 들어 정확도를 탓할 수도 있겠다. 기상청 조기경보시스템은 1차로 P파(Primary waves)를 활용해 추정규모, 예상진도를 자동 분석하고, 이후 지진분석사가 다른 지진파인 S파(Secondary waves) 신호 위치까지 확인해 정밀 조정한다. 다만 애초에 자동 추정값을 내보내는 목적이 신속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통 P파는 속도가 초당 6∼8㎞, S파는 초당 3∼4㎞로 이동하는데, 피해를 일으키는 건 P파보다 진폭이 크고 파형도 복잡한 S파다. 이런 이유로 지진으로 큰 진동이 오기 전 5초 정도의 여유만 있어도 근거리로 대피해 80%까지, 10초면 건물 밖으로 탈출해 90%까지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 충주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전 2시35분34초였고, 기상청이 통신사에 긴급재난 문자를 요청한 건 불과 9초 뒤인 오전 2시35분43초였다.
초 단위로 움직이는 지진 추정과 경보에 대해 이해하면 규모 1.1의 오차에 조금 너른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시 돌아가서, 국민의 ‘불편’은 마땅히 해소돼야 할 일이다. 한때 ‘프로불편러’(별거 아닌 일로 논쟁을 부추기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란 말은 조롱의 의미로 쓰였지만 요즘엔 프로불편러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평가도 있다. 결국 불편의 내용이 긍·부정을 가르는 기준이 될 텐데, 새벽 재난문자에 대한 일부의 항의는 기상청의 신속한 지진 대응에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아 보인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젤렌스키는 독재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0/128/20250220522470.jpg
)
![[기자가만난세상] 불편한(?) 지진 재난문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395.jpg
)
![[세계와우리]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1/128/20240321519850.jpg
)
![[강영숙의이매진] 미술관이 학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128/202502065202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