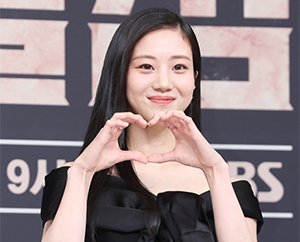요즘 사람들이 미술관에 많이 모이는 이유가 뭘까? 유명한 전시는 사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아예 입장이 불가능하고, 입장이 된다고 해도 관람객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관람 에티켓을 잘 지켜야 한다. 지금 화제가 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 전은 3월 전시 마감일까지 모두 예약이 끝났다.
2주 전, 미술관 뉴스에 빠른 친구 덕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건축가 조민석의 아트 살롱에 참여했다. 연령대도 성별도 특정할 수 없이 그냥 관객이 많아서 또 한 번 생각하게 됐다. 왜 사람들은 미술관으로 몰려드는 걸까? 2024년 화제가 되었던 그의 작업인 런던의 ‘서펜타인 갤러리 파빌리온’과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을 직접 소개해 주었다. 또 이 파빌리온 작업에서 협업했다는 김혜순 시인의 시 ‘저절로 주먹이 펴지는 손’도 읽고 싶어졌다. 작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뭔가 디테일에 강하다는 점을 조민석의 강연에서도 느꼈다. 또 쉽게 다운로드할 수 없는 독창적인 작업을 생각한다는 그의 말에도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도 잊지 못할 전시가 있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조경가인 정영선 전 ‘이 땅에 숨 쉬는 모든 것을 위하여’서였다. 전문적인 영역이라 잘 모르지만, 바닥을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 점이 독특했다. 전시 공간이 선과 면이 다가 아니고 모든 공간을 충분히 활용한 둥근, 초록의 세계였다. 복잡하면서도 복잡하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잘 살아있었다. 역시 인간이 기댈 곳은 작은 풀과 나무 그리고 공원 같은, 자연뿐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확인한 전시였다. 정영선 작가님이 신경림 선생님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지었다는 제목에서부터도 큰 위로를 받았다.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집에 가기가 싫어지는데, 그건 나만 그런 걸까. 흰색과 검은색으로 분리해 돌려야 할 세탁물, 라벨을 떼어 분리 배출할 플라스틱 쓰레기, 아침 식사 준비로 냉장고를 열었을 때 분명히 봤지만 외면한, 야채 박스에서 썩어가고 있는 양파와 고구마! 그런 것들뿐인 집으로 돌아가기가 싫어진다. 어쨌든 왜 사람들은 미술관으로 몰려드는 걸까. 아마 그건 모두 불안하기 때문이 아닐까. 다가올 세계가 궁금해서? 그런 잡생각을 하며 시위 인파로 복잡한 안국역을 지나 집으로 돌아갔다.
강영숙 소설가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젤렌스키는 독재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0/128/20250220522470.jpg
)
![[기자가만난세상] 불편한(?) 지진 재난문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395.jpg
)
![[세계와우리]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1/128/20240321519850.jpg
)
![[강영숙의이매진] 미술관이 학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128/202502065202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