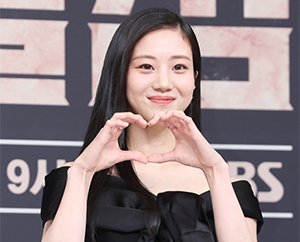국가채무비율 46.7%로 치솟아
재정건전성 지킬 청사진 절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8.5% 많은 초슈퍼 예산안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본예산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로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박근혜정부가 편성한 2017년 증가율은 3.7%였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확장 재정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취약계층의 고용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린에너지 등 한국판 뉴딜 사업에 첫해부터 21조원 규모의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다.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관급 사업이 성공을 거둔 예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현금 살포나 다름없는 지역상품권 예산을 15조원으로 늘린 것은 대선을 의식한 선심 예산이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1만6140명 증원은 두고두고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게 뻔하다.
정부가 경기 회복 못지않게 최우선으로 살필 대목이 재정건전성이다. 나라살림살이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내년 109조7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작년 적자 37조6000억원의 세 배 수준이다. 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첫해 660조원이었던 것이 내년 945조원으로 증가한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엔 1000조원을 돌파해 1070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작년 37.1%에서 내년 46.7%로 치솟는다.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가 따로 없다.
나랏빚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일이다. 개인이든 나라든 수입을 고려해 씀씀이를 조절하는 게 상식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은 이런 원칙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지출을 늘린 탓이다. 가정주부조차도 이런 식으로 살림을 하지 않는다. 더구나 코로나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 푼이라도 재정을 아껴 적재적소에 써야 한다. 그런데도 여권은 돈 쓸 궁리부터 한다.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원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30만원 정도의 지급은 50번, 100번 해도 괜찮다”고 한다.
국가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재정은 함부로 헐어선 안 된다. 정부는 조속히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관리할 청사진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런 계획도 없이 확장 재정을 반복한다면 포퓰리즘 정부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젤렌스키는 독재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0/128/20250220522470.jpg
)
![[기자가만난세상] 불편한(?) 지진 재난문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395.jpg
)
![[세계와우리]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1/128/20240321519850.jpg
)
![[강영숙의이매진] 미술관이 학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128/202502065202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