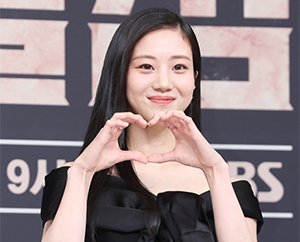지난해 6월 말 기준 대통령·국무총리, 정부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가 모두 622개다. 역대 최대다. 김대중정부 때는 383개, 이명박정부 때는 505개, 박근혜정부에서는 554개였다. “참여정부를 위원회 공화국이라고 말해도 좋다.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고 어깃장을 놓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573개) 때보다도 많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까지 따지면 2만8000개를 웃돈다. 위원회 한 곳당 위원 수를 10명으로 잡아도 지자체 전체 공무원 수(29만명)와 맞먹는 셈이다.
각종 정부 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정부 의사결정을 끌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제는 우후죽순 돋아난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이다. 이름만 내건 ‘휴면 위원회’도 부지기수다. 1년간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중앙정부 위원회가 70개나 됐고, 딱 한 번 회의를 개최한 곳도 69개였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지자체 위원회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에게 자리를 만들어 주는 용도로 위원회를 활용하는 게 문제다.
정부가 위원회에 정책 결정 책임을 떠넘기거나, 정해 놓은 정책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들러리를 세우기도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 신공항을 백지화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명분을 제공했다. ‘2050탄소중립위원회’ 역시 현 정부 핵심 정책인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합리화하는 수단이 됐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탈원전의 여론몰이용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업무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을 만큼 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결을 선호했다. 이후 ‘코로나 일상회복 지원위’ 등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었지만 정책 성과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난립하고 있는 위원회 숫자를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지난해 전체 행정기관 위원회 회의 예산만 373억7400만원이다. 혈세를 낭비하는 위원회 정비와 작은 정부 만들기는 중대한 국정과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젤렌스키는 독재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0/128/20250220522470.jpg
)
![[기자가만난세상] 불편한(?) 지진 재난문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395.jpg
)
![[세계와우리]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1/128/20240321519850.jpg
)
![[강영숙의이매진] 미술관이 학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128/202502065202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