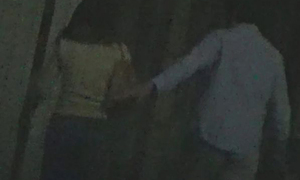딥시크 돌풍까지 놀라움 연속
자본력 아닌 인재 관리 교훈 줘
韓이 잘할 수 있는 영역 찾아야
최근 돌풍을 일으킨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본사가 있는 항저우를 찾았다. 본사 내부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이번 방문은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
베이징에서 항저우까지 이동할 때는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의 중국 자체 제작 여객기 C919에 탑승했다. 중국 ‘항공 굴기’의 상징인 C919는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가 2006년 개발에 착수해 16년 만에 완성한 중국 최초의 중형 여객기다. 기내 통로가 하나인 협동체(Narrow body) 기종으로 2022년 5월 시험 비행을 마친 뒤 감항 인증을 받아 같은 해 9월 상용 비행 절차를 완료했다. C919는 지난해 5월부터 상업 운항을 시작한 이후 약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말 100만명 이상을 수송했다. COMAC은 C919의 후속 모델로 광동체(Wide body) 기종인 C929 등의 개발도 추진 중이다.

실제 탑승해 보니 경쟁 모델인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A320과 비교해 큰 차이는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좌석 위 선반(오버헤드 빈)이 다른 기종보다 다소 작은 듯했다. 처음에는 착각인가 싶었지만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짐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성 승무원이 여성 승무원보다 더 많았다는 점도 특이했다. 거의 만석이었지만 승객들의 짐은 모두 실렸다. 창문을 여닫는 것도 조금 뻑뻑하게 느껴졌는데, 새 비행기라 그런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첫 자체제작 항공기에 대한 자부심이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에어차이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예약을 할 경우, C919 기종이 운항하는 시간대는 특별한 문양과 함께 ‘C919’라는 별도의 표시가 떴다. 기내에서도 안내방송을 통해 자체제작을 강조하는가 하면 기내식으로 나온 초콜릿 쿠키에까지 ‘C919’가 새겨져 있었다.
항저우에 도착해서는 대학과 지방정부가 손을 맞잡은 산·학·연 연구센터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전시관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던 중, 기관이 배출한 중국 ‘국가급 과학기술 인재’들의 사진과 업적이 벽에 전시된 것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전체 10여명 가운데 4~5명은 사진 없이 ‘S 박사’, ‘Q 박사’ 등 이니셜로만 표기돼 있었다. 이유를 묻자 “현재 연구가 진행 중으로, 아직 공개할 만한 시점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다. 사진촬영도 금지됐다. 중국이 과학기술 인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어떤 속도로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딥시크의 놀라운 성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개발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의 원천기술은 서방에서 훔쳐 온 것”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런 주장 중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고, 일부는 단순한 바람에 불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중국이 어떻게 여기에 도달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뜬금없이 우리도 자체 제작 여객기를 개발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미쓰비시중공업이 2008년 ‘미쓰비시 리저널 제트’(MRJ) 개발을 선언하며 자국 여객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개발이 지연된 끝에 2023년 결국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글로벌 항공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것이다. 이번 딥시크 쇼크는 AI 개발이 반드시 ‘쩐의 전쟁’만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줬다. 딥시크는 상대적으로 적은 개발비로도 세계적인 수준의 AI 모델을 만들어냈다. 대규모 투자 없이도 AI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재와 연구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데이터 수집, 비용 절감 전략 등에서 혁신적인 접근이 있다면 자본력이 부족한 곳에서도 경쟁력 있는 AI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핵심은 인재의 문제로 귀결된다. 우리는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도태되고,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스포츠 반중 정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9/128/20250209510597.jpg
)
![[특파원리포트] 中 과학기술 무서운 성장… 우리는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9/128/20250119516540.jpg
)
![[구정우칼럼] ‘극우파 서사’를 고발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3/128/20240923504094.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전쟁을 통해 본 동맹의 힘과 한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2/128/2025011251549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