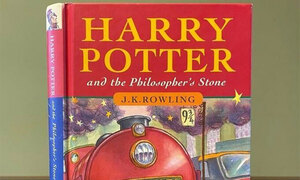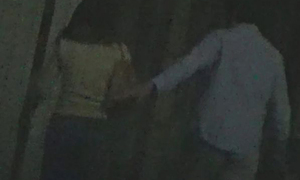인재들이 하고 싶은 일 신뢰하고 지원해야
긴 설 연휴 덕분에 세종실록 전체를 되읽을 수 있었다. 1만800여쪽의 국역 세종실록을 500쪽 분량의 독서 노트로 정리했다. 유대인의 탈무드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의 말의 터를 닦는 이야기를 길어 올리기 위함이다. 이번에 나의 눈길을 잡아끈 대목은 실록에 기록된 ‘한국인의 모습’이다. 가령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 한다”면서 세종은 제발 서두르지 말고 정밀하게 일하라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품이 가벼워서 모든 일에 떠들고 비밀을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 역시 지금도 유효한 우리의 모습이다.
흥미로운 구절은 “대개 나라에서 불러서 일을 시키면 반드시 싫어하고 꺼리지만, 스스로 서로 불러 모이면 즐겁게 일에 나간다”는 호조판서 안순(安純)의 말이다. 이 말은 곧 세종의 생각이기도 했다. 1436년 1월 함경도 관찰사에게 목면(木綿) 종자와 심는 방법을 적어 내려보내면서 세종은 다음과 같이 하명했다. “사람들은 비록 생활에 절실하게 이익됨이 있더라도 관청에서 시키면 꺼리는 마음을 내게 된다. 모름지기 강제로 심게 하지 말고,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따르게 하라.”(세종실록 18년 1월 6일) 세종에 따르면, 그 지역은 다른 곳보다 배나 추워서 백성들에게 겨울을 이겨내는 계책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목면처럼 꼭 필요한 작물조차도 관청에서 심으라고 하면 꺼린다고 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남이 시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심지어 먹고 노는 일까지도 억지로 시키면 꺼리는 마음이 생긴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욕구인 ‘자기 존중의 욕구’가 좌절되기 때문이다. 매슬로(A. Maslow)에 따르면 인간은 “이 욕구가 저지되면 열등감이나 무력함, 나약함을 느끼며, 결국 근본적인 실의(失意)로 이어지거나, 보상받으려는 성향 내지 심지어 신경증까지도 유발한다”고 한다(‘동기와 성격’ 2009). 다시 말해서 관리들이 혹은 상사가 좋은 의도로 이러저러한 방향을 제시하고 유익한 정보를 준다 해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존중의 욕구를 좌절시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서도 안 된다. 그럴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세종은 두 가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첫째,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찾아서 거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면 구성원들이 즐겁게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도자는 먼저 구성원들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세종에 따르면 국왕은 ‘백성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히 이루도록 돕는 자’이다. 물론 세종 역시 백성 마음이 바람과 같아서 일정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면 “여러 사람의 일치하지 못한 말에서 지당한 하나의 결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세종의 믿음이었다. 세제개혁을 추진하면서 17만여명의 여론조사를 하게 한 일이 그 대표적 사례다.
둘째, 깨우치고 가르쳐야[曉諭 효유] 한다. 구황에 유리한 무를 심도록 권장하면서 세종은 “대저 민심이란 옛 제도에 젖어 새 제도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무씨를 뿌려야 흉년에 살아날 수 있고 또 무가 생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반드시 꺼린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각 고을 수령들은 이 점을 유념하면서 “간절히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깨우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관경종(先官耕種), 즉 먼저 관청에서 밭 갈고[耕] 씨를 뿌려서[種] 시험해 본 다음 그 성과를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가시적인 성과에서 신뢰가 생기기 때문이다.
가시적인 성과란 그 일의 책임자, 즉 수령이 그 일에 마음을 붙이고 몸소 권장할 때 나온다. 이를 위해서 세종이 한 일은 두 가지다. 그 하나는 수령으로 하여금 ‘자기의 업(業)’을 분명히 깨닫게 했다. 세종 시대 사람들은 ‘업이란 지금 우리가 일터에서 하고는 있으나, 아직 다 이루지 못한[事爲未成 사위미성] 사명’이라고 이해했다. 살아가면서 혹은 일터에서 수행하고는 있으나 아직 완성하지 못한 목적 내지 사명이 곧 업이라는 뜻이다. 세종은 근무지로 내려가는 수령을 일일이 만나 왕과 수령의 업은 백성 먹여 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하곤 했다. 그 일을 뛰어나게 잘한 수령은 승진 차례에 얽매이지 않고 높이 승진시키기도 했다.
“대한민국 연구개발(R&D)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정부가 깨우치고 가르칠 때는 지났습니다.” 세종의 선관경종 이야기를 들은 한 과학자의 이야기다.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정부의 태도로 인해 현재 대학이나 정부출연연 소속 인재들의 사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다고 했다. 당연히 노벨과학상 같은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 지금 세계적인 원천기술 개발에 필요한 것은 천문학적인 연구비가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의 사명의식과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다. 황금알을 낳는 것은 닭 관리자가 아니라 바로 암탉이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정미칼럼] 보수 여당의 착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1/128/20241111518135.jpg
)
![[설왕설래] 스포츠 반중 정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9/128/20250209510597.jpg
)
![[기자가만난세상] ‘호랑이’에서 내려오지 않는 자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06/07/128/20210607516846.jpg
)
![[박현모의 한국인 탈무드] ‘존중의 욕구’ 채워줘야 발전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0/128/2025021051352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