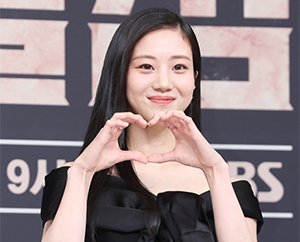최근카이스트(KAIST)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도 ‘점수 위주 학생선발’이라는 고질적인 대학입시의 병폐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으로 입학사정관제를 꼽고 있다.
최근카이스트(KAIST)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2010학년도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확대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도 ‘점수 위주 학생선발’이라는 고질적인 대학입시의 병폐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으로 입학사정관제를 꼽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시행 중인 대부분 대학들이 내신·수능 성적에 각종 수상·대외활동 경력 등 ‘플러스 알파’까지 요구해 대학들의 가치관,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학생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 개혁이 중요하다”면서 “대학들이 입시안을 바꾸면 정부가 보상해 주겠다”고 밝혔다. 성적이 아닌 잠재력을 보고 선발하는 입시안을 채택하는 대학, 즉 입학사정관 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올해 입학사정관제를 실시하는 46개 대학에 246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제도가 정착되면 시험 점수가 아니라 자라온 환경, 성장 가능성 등을 보고 유능한 학생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2009학년도 주요 대학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선발한 결과는 이 같은 기대와 거리가 멀다. 주로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나 농어촌 출신 학생 등 정원 외로 선발하는 전형에만 적용하거나,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학생회 임원 출신과 내신·수능 일정 이상 성적 등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제도의 취지를 살려 성적보다는 ‘잠재력’을 보고 뽑았다는 학생들도 대부분 학생부 성적이 우수했고 그외에 대외활동이나 수상경력도 화려했다. 서울 소재 K대학의 경우 7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을 한 전교 총학생회장, 각종 경시대회 등에서 탁월한 실적을 나타낸 학생, 학생부 과목 석차등급이 1.5 이내인 학생 등을 뽑았다.
이 같은 문제는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부족에서 발생하고 있다. 학생선발 업무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성적이나 수상경력과 같은 객관적인 실적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입학사정관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적게는 1∼2명, 많게는 6∼7명 정도의 사정관을 두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기간제 교사나 사교육업체 관계자, 일반회사 근무 경험자 등으로 학생선발과 무관한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다. 더구나 대부분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소신 있게 업무에 집중할 수 없고 이직률도 높다.
한 대학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은 인물을 보는 안목과 분석력에 교육철학까지 고루 갖춰야 하는데 이제 막 도입된 제도라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앞으로 3∼4년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야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젤렌스키는 독재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0/128/20250220522470.jpg
)
![[기자가만난세상] 불편한(?) 지진 재난문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395.jpg
)
![[세계와우리]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1/128/20240321519850.jpg
)
![[강영숙의이매진] 미술관이 학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128/202502065202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