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국내 임상시험 발전을 위해 연구진, 피험자, 정부 등 모든 구성원의 인식 제고가 절실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외형상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임상시험관리규정(KGCP)을 갖고 있는 만큼 이제는 현실에서 이를 잘 지켜 나가는 연구진의 윤리적 소양과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피험자의 동의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감독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행정지도 강화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외부인사 참여 확대 등도 개선돼야 할 사항으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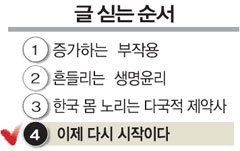 ◆연구진 윤리교육이 첫걸음=지난해 식약청에서 발간된 ‘임상시험 교육시스템 개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임상시험 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 중 윤리적 소양과 임상시험 실무능력 등을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43%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임상시험 참여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연구진 윤리교육이 첫걸음=지난해 식약청에서 발간된 ‘임상시험 교육시스템 개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임상시험 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자 중 윤리적 소양과 임상시험 실무능력 등을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43%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임상시험 참여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식약청이 지난해 처음 관련 교육을 4회 실시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 김명희 이화여대 생명윤리법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IRB나 제약사 모니터팀이 임상시험을 일일이 감시할 수 없는 만큼 연구기관 스스로 윤리적 소양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지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다 확실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도 거론됐다. 식약청 용역조사의 연구책임을 맡았던 서울대의대 박병주 교수(예방의학교실)는 보고서에서 “재교육 과정과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국제적 전문성을 지닌 임상시험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올바른 동의문화 정착돼야=연구 윤리 확립과 함께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문화 확산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옥주 교수(서울대 임상연구심의회 총무 간사)는 “미국에 비해 국내 피험자들은 연구에 참여하는 자발성이 떨어진다”며 “임상시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스스로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모임인 한국제약의약협학회(KSPM) 이일섭 회장도 “정부가 임상시험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지만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에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며 “피험자들이 동의서 사본을 받거나 부작용 설명을 들을 권리 등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면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잘 대처하게 되어 더 큰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NIH)처럼 우리 식약청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 현황을 온라인으로 파악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행정지도 강화 및 IRB 외부인사 확대=현행 관리감독제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식약청 행정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상태에선 임상시험의 윤리 확립은 ‘먼나라’ 얘기라는 것이다.
지난해 연세대 법대에서 ‘임상시험 부작용에 관한 민사책임 범위 연구’에 관한 석사논문을 제출한 장인수씨(연세대 의과대 교무팀)는 “국내 임상연구 관련 법령은 선진국 수준이나 IRB의 독립성이 결여되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며 “임상시험 관리규정을 모범적으로 지키는 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줘 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관련 규정 준수에 태만한 기관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기종 백혈병 환우회장은 “IRB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환자모임이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인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기획취재팀=김동진·우한울·박은주·백소용 기자
special@segye.com
specia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부산이 소멸 위기라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5/128/20241105500355.jpg
)
![[박희준칼럼] 혼돈의 정치, 사법부가 중심 잡아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9/128/20240219517565.jpg
)
![[기자가만난세상] 北·中 접경지 통일 염원은 여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04/128/20241104513061.jpg
)
![[최종덕의우리건축톺아보기] 단풍과 단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27/128/2023112751698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