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이후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번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적어도 글로벌 작가라면 그의 작품이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2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작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도서출판 문학동네 염현숙 편집국장은 한국문학의 현주소를 국외 독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번역 인력풀 확대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신경숙씨 소설이 외국에서 호평을 받고 우리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세계 무대에서 통하는 걸 보면 한국문학의 콘텐츠가 중국·일본에 비해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염 국장은 “다만 한국문학을 외국에 정확히 알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역량 있는 번역가를 대거 양성해 우리 문학작품을 영어·불어·독어·스웨덴어 등으로 옮기는 작업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문학작품 번역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학번역원이 꾸준히 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작가의 작품을 ‘공평하게’ 번역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문학작품 번역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학번역원이 꾸준히 하고 있다. 문제는 여러 작가의 작품을 ‘공평하게’ 번역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권영민 단국대 석좌교수는 “한 작가의 작품을 이미 번역했는데 왜 또 그 작가 것을 번역하느냐고 하도 말들이 많으니 심지어 번역원장이 국회에 불려가 호통을 듣기도 한다”면서 “예술, 특히 문학 분야에서 평등주의는 옳지 않다. 작가가 다르고 작품 질이 다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예를 들어 한 해에 작품 200편을 번역한다고 하면 200명의 작품을 한 편씩 할 게 아니라 좋은 작가의 작품은 한꺼번에 10∼20편씩 번역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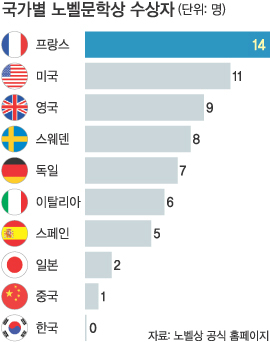 한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반면 요즘은 ‘한국적인 것을 버리고 세계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둘 가운데 정답은 없겠으나 한국 고유의 독창성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미덕이란 목소리가 높다.
한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반면 요즘은 ‘한국적인 것을 버리고 세계인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둘 가운데 정답은 없겠으나 한국 고유의 독창성은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미덕이란 목소리가 높다.
홍석표 이화여대 중문과 교수는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받은 모옌이나 2000년도 수상자 가오싱젠(수상 당시 프랑스 국적)의 작품을 보면 중국적 전통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세계화가 대세인 듯하지만 역시 고유의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보편성이란 이름 아래 서양문학만 따라가봤자 결국 서양의 ‘아류’밖에 더 되겠느냐. 한국문학만이 보여줄 수 있는 창조적 측면의 계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해병대전우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8/128/20250418500033.jpg
)
![[기자가만난세상] 지자체장 대선 경선行, 행정공백 우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7/128/20250417521238.jpg
)
![[세계와우리] 美·中 극한 경쟁, 한국의 선택지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7/128/20250417521375.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너무 늦기 전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17/128/20250417521269.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