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이상 학력자는 출산율과 사망률도 중·고등학교 최종학력자와 견줘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을 보여 학력 격차가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 현상이 심화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저학력 인구가 사회·경제적 안정성이 떨어져 결혼을 덜 하고, 아이도 덜 낳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장수한다는 것이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고학력일수록 건강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학력과 사망률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혼인·출산율이 저조하고, 이혼·사망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졸 학력자는 출산율이 가장 낮고, 이혼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수준별 출생·사망·혼인·이혼 분석 : 2000∼2015년'을 발표했다.
2015년 기준 20세 이상 남성 전체의 혼인율(1000명당 혼인건수)은 15.1건이었다.
대졸 이상은 24.5건으로 가장 높았고, 고졸 9.8건, 중졸 이하 3.6건 순이었다.
◆학력간 임금 격차, 혼인·출산율 차이로 이어져
여성 전체 혼인율은 14.6건이었다. 대졸 이상은 28.6건, 고졸 10.0건, 중졸 이하 2.3건으로 추이가 비슷했다.
2000년 이후 15년간 혼인율은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서 꾸준히 감소했지만, 특히 남자 고졸의 혼인율은 8.9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통계청은 "혼인·출산이 가장 심각하게 떨어진 계층이 고졸 이하"라며 "고졸 이하는 대졸자와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결국 학력간 임금 격차가 사회적 안정성 부분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자의 평균 초혼연령은 32.6세로 대졸 이상이 32.5세, 고졸 32.8세, 중졸 이하 36.5세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을 빨리 한 셈이다.
남성 중졸 이하는 지난 15년 사이 평균 초혼연령이 4.0세 올라 가장 증가 폭이 컸다.
고졸 여성은 다른 학력의 여성보다 아이를 덜 낳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20∼59세 여성 전체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23명이었다.
중졸 이하가 1.60명으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은 1.32명, 고졸 1.02명 순이었다.

지난 15년간 여성 고졸의 합계출산율은 0.49명 줄어 가장 감소 폭이 컸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중졸 이하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1000명당 출산)이 가장 높았다. 중졸 이하 20대 초반은 111.5명이었고, 후반은 106.4명이었다.
30대부터는 대졸 이상의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 대졸 이상 30대 초반 출산율은 129.7명, 후반 56.8명이었다.
이에 따라 평균출산연령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 2015년 평균출산연령은 32.5세, 고졸과 중졸 이하가 각각 31.8세, 28.7세였다.
◆학력-사망률 상호 영향…학력변수, 사망률의 결정적 변수 아냐
2015년 20세 이상 남자의 이혼율(1000명당 이혼 건수)은 5.4건이었다. 이중 고졸이 6.4건으로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가 5.7건, 대졸 이상은 4.4건이었다. 고졸남 이혼율이 대졸 이상보다 1.5배 높은 것이다.
이혼율은 7.2건을 기록한 2000년 이후 교육 수준과 무관하게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세 이상 여자의 이혼율은 5.3건이었으며, 남자와 마찬가지로 고졸이 7.5건으로 가장 높았고 대졸 이상이 4.4건, 중졸 이하가 3.5건이었다.
남자 고졸의 이혼율 비(고졸/대졸 이상)는 20대가 1.1배로 가장 적었고, 30대가 2.2배로 가장 높았다.
최근 5년간 이혼율 추이를 보면 남녀 모두 고졸•대졸 이상의 이혼율은 20∼40대에서 감소했으나, 50대에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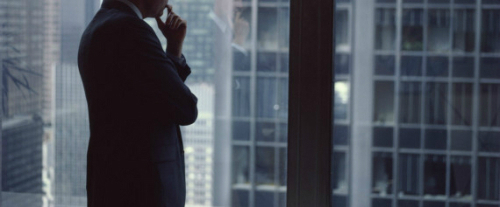
평균 이혼연령은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났다.
남자의 평균 이혼연령은 대졸 이상 44.3세, 고졸 46.2세, 중졸 이하는 54.2세였다. 여성의 평균 이혼연령도 대졸 이상 40.1세, 고졸 42.9세, 중졸 이하 50.0세 순이었다.
2000년 이후 평균 이혼연령은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2015년 60세 이상 사망률(1000명당 사망자 수)은 24.0명이었다. 이가운데 중졸 이하가 29.2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졸 이상(14.8명), 고졸(14.6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00년 이후 60세 이상 사망률은 교육수준과 관계없이 모두 감소했으며, 최근 5년간 대졸 이상의 감소 폭이 2.8명으로 가장 컸다.
교육수준별 사망률 비(중졸 이하/대졸 이상)는 남자(9.1배)보다 여자(20.2배)가 더 컸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국가 간 '연령표준화 사망률' 비율을 보면 한국 고졸의 사망률은 대졸 이상보다 남자 1.2배, 여자 1.1배 높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평균인 남자 1.2배, 여자 1.1배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졸 이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대졸 이상보다 남자 2.0배, 여자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OECD 평균(남자 1.3배, 여자 1.2배)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학력과 사망률 간 상호 영향은 확실히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학력이 낮을 수도 있어 학력변수가 사망률의 결정적인 변수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대검 감찰부장 구인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4/128/20250424500373.jpg
)
![[세계포럼] 국격 추락시킨 ‘헤이트 스피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4/128/20250424500346.jpg
)
![[세계타워] 추경은 타이밍… 증액보다 속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4/128/20250424500207.jpg
)
![[사이언스프리즘] 드럼통과 갈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4/24/128/20250424500225.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