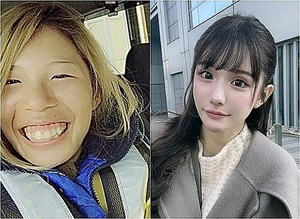인도에서도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아 명문대에 대한 갈망이 많다고 한다. ‘세 얼간이’(감독 라지쿠마르 히라니)는 성적 중심의 인도 대학의 교육문제를 코믹한 방식으로 전해준다. 영화는 도입부에서부터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인생은 경쟁이라고 배워 왔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짓밟힌다”는 대사로 경쟁 제일주의를 비판한다. 인도에서는 취업이 잘되는 공대를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영화 속 세 얼간이는 인도의 명문 공대에 재학하는 다양한 가정형편 출신의 세 명의 공학도를 말한다. 부모가 원하는 공학도가 되기 위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포기하는 파르한(마드바한)과 병든 아버지와 식구들을 책임지기 위해 무조건 대기업에 취직해야만 하는 라주(셔먼 조시)에게 천재적 두뇌의 소유자이면서 모든 상황에 새로운 해법으로 대응하는 란초(아미르 칸)는 자극제가 된다.
기계에 천재적 재능이 있지만 과제를 제 기간에 제출하지 못해 교수의 핀잔을 듣고 졸업하지 못하게 된 란초의 친구 조이 로보는 기타를 치며 한탄하다. “내가 살아온 인생, 내가 아니었네. 단 한순간만이라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 그의 가슴속에 꿈은 있지만, 세상이나 대학에서의 경쟁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잣대가 자신을 찾지 못하게 한다며 결국 그는 목을 매게 된다.
란초는 친구가 완성하지 못한 과제를 완성해 주기도 하지만,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단순 암기만을 최고로 여기는 답답한 모범생 친구는 골탕먹이기도 한다. 이 영화에서 란초가 장난처럼 벌이는 에피소드는 경쟁으로 눈앞이 가려진 학교와 학생들에게 교육 본연의 목적을 환기시킨다. 란초의 생각과 삶처럼 현실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육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황영미 숙명여대 교수·영화평론가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반달곰 복원사업 20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0/128/20241030519289.jpg
)
![[세계포럼] 기로에 선 한동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01/128/20231101522921.jpg
)
![[세계타워] 잘못된 만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21/128/20240221519128.jpg
)
![[사이언스프리즘] AI를 통제할 수 있는 미래가 올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0/128/2024103051769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