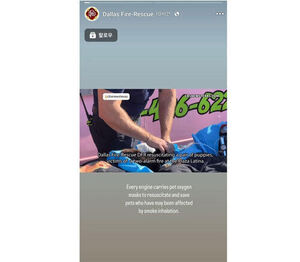죽음이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일까. 죽음은 인류가 사유하기 시작할 무렵부터 화두였다. 이 세상 모든 문명과 사회, 철학, 그리고 종교의 시작점은 바로 이 죽음에 맞물려 있다. 하지만 21세기 현대과학도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
사진작가 박찬호(48)는 지난 10여년 동안 오로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곳곳을 헤맸다. 돌아갈 ‘귀(歸)’라는 한 글자를 통해 자신만의 잣대로, 그리고 특유의 프레임으로 죽음 문제를 천착해왔다.

‘歸(RETURN)’는 죽음에 대해 끈질기게 탐구해온 그의 첫 작품집이다. 이 사진집에는 유교와 불교 의식뿐 아니라 우리 전통 장례식과 무속식 제의들이 80여점 흑백작품으로 실려 있다.
죽음에 대한 박 작가의 집착은 열 살 때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입원하면서 시작됐다. 많은 시간을 어머니 곁에서 보내며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는 이들과 애통해하는 가족들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들었다.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진 환자들의 침상이 차례로 비워지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다. 어머니 타계 후 상실감으로 힘겨웠던 그는 하루하루를 방황 속에서 보냈다. 14살 때 가출했고, 30대 후반이 돼서는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결국 건강이 나빠져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병이 위중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들어야 했다. 죽음 그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겪을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남겨질 아이들이 감당해야 할 상처가 더욱 두려웠다. 한국의 죽음을 다큐멘터리 형식의 사진 작업으로 맞닥뜨려 보고자 한 것은 이 같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기도 했다.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박 작가는 전통 장례식, 유교식 제사, 불교식 제의와 다비식, 무속식 제의 등 현장을 수없이 찾아다니며 그 답을 찾아왔다. 그는 “죽음은 나에게 더 이상 과거의 일만이 아니라 다가올 현실이자, 모든 인간에게 닥쳐올 일이기도 하다”며 “죽음을 기록하는 일은 곧 나의 죽음과 대면하는 일이고 준비하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생명마저 금액으로 환산되는, 물질적 가치가 그 무엇보다 우선되는 현시대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남은 삶 동안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가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해줄 것입니다.”
사진이 선사한 치유의 힘일까. 박 작가는 사진이야말로 자신의 트라우마와 맞닥뜨리는 데 도움을 준다고 들려준다.
사진집 발간과 아울러 전국 순회전시회도 열린다. 오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대구 아트스페이스 루모스에서, 6월 15일부터 28일까지는 광주의 갤러리 혜움에서 관람객을 맞는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대통령 경호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7/128/20250107521816.jpg
)
![[데스크의 눈] 궁예가 尹대통령에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3/128/20241113500131.jpg
)
![[오늘의시선] 소득 양극화 해소는 선택 아닌 필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7/128/20250107521706.jpg
)
![[안보윤의어느날] 배려 감사합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3/128/202411135001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