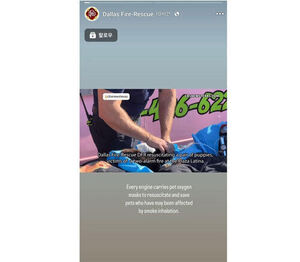특정분야 수가 높이면 다른 쪽은 낮춰야
우리나라 2022년 국민의료비 규모는 209조원으로 GDP의 9.7%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3%를 넘어섰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GDP의 5%가 안 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국가였다. 2018∼2022년의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0.1%, 우리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는 보기 힘든 두 자릿수 증가율이다. 한국의 높은 증가율은 OECD 국가 사이에서도 이례적인 것으로 인용되고 있다. 문제는 그 증가가 둔화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계속되고 ‘간병비의 사회화’는 피할 수 없다. 이 둘은 우리 사회의 의료비 폭증을 예고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건강보험 지출’을 충당할 ‘건강보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가다.
우선 ‘건강보험 지출’ 측면을 보자. 지금까지는 국민의료비의 급증이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이는 건강보험이 국민 개개인에게 의료비 부담을 떠넘겨왔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간병비다. 하지만 고령사회에서 더는 간병을 개인의 책임으로 맡겨두기 어렵다. 최근 정치권에서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보호자 출입 금지’를 통해 급성기병원의 입원을 정상화하고, 요양병원의 간병인 고용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해나가려면 건강보험은 ‘지출 폭등’을 각오해야 한다.

다음은 ‘건강보험 수입’ 측면이다. 건강보험의 주요 재원은 ‘보험료’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7.09%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걷는다. 보험료를 걷는 방식을 ‘건보료 부과체계’라고 한다. 정부는 2018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했다. ‘평가보험료’는 폐지되었고, 대신 ‘최저보험료’가 도입되었다. 총선을 앞둔 현 정부는 그간 명분 없이 유지되던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없앤다고 한다. 또한 재산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파격 인상했다. 이는 저소득자의 ‘미미한’ 재산에 부과되었던 ‘과도한’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어줄 것이다. 그만큼 보험료 ‘수입’은 줄어든다. 이는 전체 보험료율의 증가로 보완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료율이 8%를 넘지 못하게 못 박고 있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의료비 지출의 조절’과 앞뒷면 관계인 이유다.
첫째, 2001년에 도입된 ‘상대가치점수의 환산지수 계약’ 방식을 용도폐기, 전면 개편해야 한다. 매년의 환산지수계약은 의료가격의 ‘복리 인상’에 따른 진료비의 폭등을 가져왔다. ‘재정중립적’ 환산지수 인상률의 자동산출 기전을 도입하거나, 일부 항목에 대한 ‘고시가 개정’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포괄수가제와 가치기반 지불보상방식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에서 급여하는 항목을 지급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당장 안 되면, 당분간 최소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의 절반 이상은 남기도록 해야 한다. ‘필수의료’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다. 공보험의 법정본인부담을 실손보험이 보상한다고 해서 불필요한 이용이 생길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선택성이 높은 의료’는 실손보험의 보상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건강보험이 ‘예비급여’로 설정했는데 실손보험이 그 본인부담을 없애면 어찌하자는 것인가.
셋째, 특정 분야의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가격과 의료비를 낮추는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소위 ‘필수의료’에 대한 최근의 논의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도 평균 의료 가격과 의료비 지출 규모는 높다. 모든 행위의 수가가 매년의 환산지수계약으로 균일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상대가치점수를 매달 별도로 올려왔다. ‘의대정원 축소’가 ‘의사 달래기’였다면, 계속되는 수가 인상은 ‘의사 눈치 보기’다. 지난 20년간 우리 건강보험과 의료제도에서 의료비 급등을 가져온 배경이다. 이제 이러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대통령 경호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7/128/20250107521816.jpg
)
![[데스크의 눈] 궁예가 尹대통령에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3/128/20241113500131.jpg
)
![[오늘의시선] 소득 양극화 해소는 선택 아닌 필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7/128/20250107521706.jpg
)
![[안보윤의어느날] 배려 감사합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13/128/202411135001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