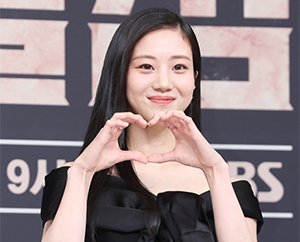영화산업의 대세를 거스르는 영화 한 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브래디 코베 감독의 ‘브루탈리스트’이다. 지난해 베니스 영화제 은사자상 수상을 시작으로 골든글러브상 주요 부문을 석권하고 올해 가장 강력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로 손꼽히는 이 영화는 서막/1부/인터미션/2부/에필로그 구조로 설계된 215분 러닝 타임의 영화이다. 오직 성인 관객만을 대상으로 한 영화의 상영 시간이 215분이라면 그 자체로 대단한 용기요 야심이다. 이 영화는 그 용기와 야심에 부응하는가? 그렇다.
감독은 195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와 고군분투한 이민자의 삶을 그리기 위해 1954년 영화산업에 도입된 비스타비전 16.6:1의 화면비를 활용한다. 비스타비전은 지금은 영화산업에서 거의 도태된 포맷이지만 코베 감독은 20세기 산업화 시기의 미국 사회 이민자들의 삶을 담아내기 위해 이 사라진 포맷의 물성과 감성을 이용했다. 물론 영화가 그려내는 20세기 중반 필라델피아와 뉴욕의 모습은 더 이상 현재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라진 장소의 시간성을 재현하기 위해 감독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원본과 가장 유사한 풍경을 찾아 비스타비전으로 촬영했다는 점은 여러 면에서 흥미롭다. 이것은 신기루인가? 미국 내 이민자들의 유령 같은 존재감은 이런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만이 표현될 수 있는가?

영화는 미국 주류사회가 유대인과 흑인으로 대표되는 이민자들의 재능을 존중하고 그들이 활동할 공간을 열어주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와 경멸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을 장면 장면 깊숙이 찔러넣는다. 이민자들은 그러한 환경에서 고통받고 갈등하면서 주류사회의 요구에 맞춰 자신의 정체성을 탈색하거나 저항했다. 감독은 라즐로라는 헝가리 출신의 천재적인 건축가와 그가 선택한 브루탈리즘 양식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의 현실을 그려낸다. 영화를 보는 관객은 당연히 이 영화가 라즐로라는 실존인물을 다룬 전기영화라 생각하게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는 사실과 다르다. 라즐로는 전적으로 허구의 인물이다. 영화에는 압도적인 종교적 아우라를 발산하는 라즐로의 브루탈리즘 건축이 등장하지만 그가 실존인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역시 실재하는 건축물이 아니다. 영화의 에필로그에는 라즐로의 건축에 대해 헌사를 보내는 1980년 베니스 비엔날레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허구이다. 심지어 비엔날레가 시작된 1980년대는 건축사적으로 오히려 브루탈리즘이 배척된 시기이다. 그렇다면 이 영화는 그저 거대한 페이크에 불과한가? 시오니즘이라는 결말과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영화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다. 이런 의문은 지나치게 성급하다. 영화는 아메리칸 드림과 이민자들의 역사, 종교, 시오니즘에 대해 매우 정교하고 기품 있게 논쟁의 계단을 쌓아 올린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 2주간의 인터미션을 가진 뒤, 2025년 3월 7일 글의 2부에서 영화가 설계한 논쟁을 다뤄보겠다.
맹수진 영화평론가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젤렌스키는 독재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0/128/20250220522470.jpg
)
![[기자가만난세상] 불편한(?) 지진 재난문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395.jpg
)
![[세계와우리]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1/128/20240321519850.jpg
)
![[강영숙의이매진] 미술관이 학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128/202502065202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