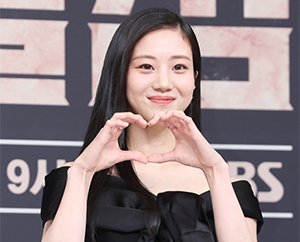|
| ◇길거리로 밀려난 노들 장애인야학 학생들이 2일 서울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 천막학사를 설립한 후 첫 수업을 하고 있다. 이종덕 기자 |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를 맴도는 추위가 기승을 부린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조촐한 개학식이 열렸다. 노들 장애인 야간학교의 천막 개학식이다. 14년간 공부해 온 터전을 잃은 이들은 이날부터 길거리에서 수업을 하게 된다. 개학식이면 으레 있을 법한 교장 선생의 훈화도, 방학 동안 밀린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는 모습도 이 자리엔 없었다. 추위에 얼굴과 손이 발갛게 얼면서도 오로지 “공부하고 싶다”는 배움에의 열망만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1993년 8월, 광진구 구의동 한국소아마비협회 소속 기관인 정립회관에 공간을 임대해 개교한 이래 노들 장애인 야학은 14년 동안 제도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의 교육문제를 담당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말 정립회관 측으로부터 운영공간과 관리비 부족 등을 이유로 12월 31일까지 퇴거하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이들은 교육공간을 잃게 됐다. 지금까지 170여명의 학생이 이곳을 수료했고 268명의 학생이 검정고시에 응시해 220명가량의 합격자를 배출한 노들 야학은 장애인들에겐 학교 이상의 공간이었다. 정부가 제공하지 못한 교육의 기회를 주었고 장애인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준 곳이기 때문이다.
노들 야학 박경석(48) 교장은 “이 추운 겨울에 고생시켜 미안하다”며 “그래도 수업은 멈출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장애인 야학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서로 회피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으면 법을 고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가 “우리도 공부해서 서울대는 못 가더라라도 영화관에서 자막이라도 읽고 싶다”고 외치자 자리에 모인 학생들도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들 야학에서 3년째 공부해 온 배덕민(42)씨는 “집이 노원구라 다니기 멀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데서 공부할 때가 좋았다”며 “하루빨리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공원 한쪽 ‘길거리에 나앉아도 수업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현수막이 걸린 천막 안에서 이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원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투쟁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박 교장은 “불법은 하기 싫은데 공부는 하고 싶다”며 학생과 시민들에게 끝까지 함께할 것을 호소했다.
이태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젤렌스키는 독재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0/128/20250220522470.jpg
)
![[기자가만난세상] 불편한(?) 지진 재난문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395.jpg
)
![[세계와우리]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1/128/20240321519850.jpg
)
![[강영숙의이매진] 미술관이 학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128/202502065202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