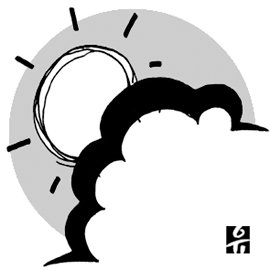 동일한 일상이 어김없이 반복되면 심정이 어떻겠는가. 1992년 개봉된 ‘사랑의 블랙홀’은 이색 설정에 주인공 필을 가둬 놓고 이야기를 끌어간다. 필은 매일 똑같은 시간대에 깨고, 전날 같은 장소에서 마주친 이웃을 다시 만나 어제 대화를 되풀이한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격이다.
동일한 일상이 어김없이 반복되면 심정이 어떻겠는가. 1992년 개봉된 ‘사랑의 블랙홀’은 이색 설정에 주인공 필을 가둬 놓고 이야기를 끌어간다. 필은 매일 똑같은 시간대에 깨고, 전날 같은 장소에서 마주친 이웃을 다시 만나 어제 대화를 되풀이한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격이다.
필은 방송사 기상통보관이다. 그런 이가 시골의 계절 축제를 취재하려다 폭설에 발이 묶여 시간의 마법에 걸리고 만 것이다. 기상 전문가가 날씨 때문에 수인(囚人)이 된다는 설정이니 자못 역설적이다.
‘삼국지연의’의 제갈공명은 호풍환우(呼風喚雨)의 신통력을 발휘했다지만 범속한 중생은 내일 날씨를 어림잡는 것도 쉽지 않다. 기상 전문가도 그렇다. 19세기 본격화된 일기예보의 역사는 오류로 점철돼 있다. 예측이 쉬웠다면 수많은 전쟁의 승부가 날씨로 갈렸을 리 없다. 오늘날 미국 기상산업의 규모가 연 300조원, 한국이 연 7조∼8조에 달할 리도 만무하다. 기상학은 예단이 어려운 ‘복잡계’ 학문의 전형인 것이다.
국내 민간 기상사업자연합회가 그제 도발적인 제안서를 냈다. “민간사업자도 언론을 통해 기상예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민·관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자”고 한 것이다. 5주째 주말예보가 빗나가 조롱받는 기상청에 강펀치를 날린 셈이다. 반응이 쌀쌀할밖에. 기상청은 “국민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일축했다.
지난해에는 변희룡 부경대 교수(환경대기과학)가 ‘기상청의 예보 독점이 오보를 부른다’는 견해를 공표했다. 그때 기상청이 내세운 방패막이도 혼란 방지였다. 그런데 ‘혼란’이라니…. 과거 한때 빗발치던 ‘야간 통금’ 폐지론도 같은 명분에 밀려 묵살되지 않았던가. 생뚱맞은 감이 없지 않다.
기상청은 기상위성, 관측선 확보 등의 돈 드는 대안에 몰두하는 눈치다. 미덥지 못하다. 혈세를 들여 슈퍼 컴퓨터를 도입한 이후로 더 틀리는 날씨예보로 골탕 먹는 국민 심정도 헤아려야 할 것 아닌가.
민간 제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 등도 그러고 있지 않은가. 자유경쟁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기상청의 ‘혼란’ 예보가 적중하는지 지켜본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날씨오보라는 쳇바퀴를 계속 돌리지는 말자.
이승현 논설위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얼굴에 두꺼비 사진 합성… 모욕죄 처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1/22/128/20241122500672.jpg
)
![[기자가만난세상] 의원은 ‘직권남용’, ‘갑질’도 위임받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2/01/128/20231201514586.jpg
)
![[세계와우리] 트럼프 2기 맞아 냉철한 협상 준비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5/128/20240215519554.jpg
)
![[교육의미래] AI·디지털 시대의 성인 평생교육 서둘러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08/128/20240208515074.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