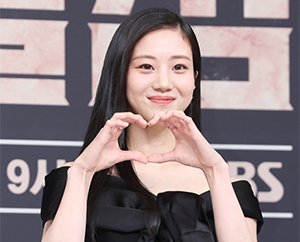경력 1년도 채 안되는 초보 강사들만 수두룩
 전국 초·중·고교에 학생들의 영어 친숙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시행한 원어민 강사 제도가 선발과정 허점 등으로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무려 7000명 이상의 원어민 강사들이 올해 초·중·고 교육 현장에 투입됐지만, 상당수 원어민 강사들이 수입이 짭짤한 학원으로 옮기거나 아예 무단이탈까지 한다. 많은 영어교사들은 “1년에 수천만원씩 들이는 원어민 강사가 정말 제 값어치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아이를 가르친 경험조차 없는 이들이 한국에서 제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한다.
전국 초·중·고교에 학생들의 영어 친숙도를 높이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시행한 원어민 강사 제도가 선발과정 허점 등으로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무려 7000명 이상의 원어민 강사들이 올해 초·중·고 교육 현장에 투입됐지만, 상당수 원어민 강사들이 수입이 짭짤한 학원으로 옮기거나 아예 무단이탈까지 한다. 많은 영어교사들은 “1년에 수천만원씩 들이는 원어민 강사가 정말 제 값어치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아이를 가르친 경험조차 없는 이들이 한국에서 제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지적한다.
◆수요 많은 사교육 현장 ‘기웃’=교육현장 관계자들과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 원어민 강사들이 학원 등 또 다른 수입원을 찾아 기웃거리는 등 ‘잿밥’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많다. 학원으로 전직도 쉽고 학교에 비해 보수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강북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원어민 강사들이 원할 때 소규모 보습학원에서는 별다른 서류 없이 일할 수 있다”며 “돈맛을 보면 학교 수업에 관심이 없어지고, 결국 재계약 없이 아예 학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그렇다 보니 원어민 강사가 한국에 들어와 학교에서 1년 이상 가르치며 경험을 쌓는 사례는 드물다. 2008년 전국 학교에 배치한 5805명의 원어민 강사 중 한 학교에 1년 이상 근무자는 1309명(23%)이었고, 2∼5년 근무자는 모두 787명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반면 1년 미만인 원어민 강사는 3709명(64%)이었다. 원어민 강사 대부분이 ‘초보’인 셈이다.
 ◆“한국이 싫다”며 무단 이탈도=경기 남부지역 A중학교는 이번 여름방학 시작 직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부랴부랴 새로 받았다. 오기로 한 원어민 강사가 갑자기 “한국에 가기 싫어졌다”고 통보한 탓이다. 결국 학교 측은 깔끔한 주택에 이불과 베개,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등 모든 생활용품도 새로 사주는 등 많은 지출을 해야 했다. “가르치려는 열정은커녕 사교성이 없어 수업도 진행하지 못하더라”며 “오직 관심은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사귄 한국인 여자친구에게 가 있는 듯했다”(이 학교 B교사)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이 싫다”며 무단 이탈도=경기 남부지역 A중학교는 이번 여름방학 시작 직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부랴부랴 새로 받았다. 오기로 한 원어민 강사가 갑자기 “한국에 가기 싫어졌다”고 통보한 탓이다. 결국 학교 측은 깔끔한 주택에 이불과 베개,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등 모든 생활용품도 새로 사주는 등 많은 지출을 해야 했다. “가르치려는 열정은커녕 사교성이 없어 수업도 진행하지 못하더라”며 “오직 관심은 미국에서 인터넷으로 사귄 한국인 여자친구에게 가 있는 듯했다”(이 학교 B교사)는 극단적인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아예 근무하던 학교를 그만두고 생활이 어렵다며 ‘야반도주’하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C고교에서 원어민 교사가 연락이 두절됐다. 학교 측은 행적을 수소문했고 그가 이미 전날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했다. 학교 측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야 그가 떠난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 벌 수 있는 돈이 줄었다.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 이 학교 D교사는 “일부이겠지만, 원어민 강사가 자신의 일을 얼마나 가볍고 하찮게 여기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말 통하는 몇몇 학생과 이야기할 뿐 영어에 친숙하지 않은 아이와는 말도 하지 않았다. 계속 있어도 교육적 차원에서 별 도움이 안 되는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원어민 강사, 선발·관리 재점검해야=이처럼 상당수 원어민 강사들의 이탈이 속출하는 것은 우선 원어민 강사의 수급구조가 애초에 잘못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통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민 교사 초청 프로그램(EPIK)을 통해 들어오는 원어민 강사는 학교 현장에서도 양질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지역 교육청이 직접 나서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학교 현장에 투입된 원어민 강사 7088명 중 EPIK로 들어온 사람은 전국에서 1339명(19%)이었다. 반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체 등에 위탁해 조달한 강사는 3779명(53%)이었고, 학교가 직접 구한 강사도 1798명(25%)이나 됐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원어민 강사는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 자체 사업이다 보니 선발, 관리 문제에 허점이 보인다”며 “원어민 강사 채용 시 선발기준과 검증을 강화하고 일단 채용했을 때 출국 관리 등 제대로 운용하도록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 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며 올해 하반기쯤 대책을 내놓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젤렌스키는 독재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0/128/20250220522470.jpg
)
![[기자가만난세상] 불편한(?) 지진 재난문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395.jpg
)
![[세계와우리]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1/128/20240321519850.jpg
)
![[강영숙의이매진] 미술관이 학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128/202502065202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