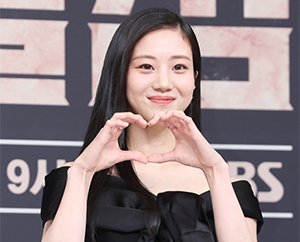눈발이 소나무를 비껴 흩날린다. 때론 휘모리바람에 눈이 공중을 부양하기도 한다. 이즈음 산중 설경이다. 사진작가 권부문(56)은 속초에 머물며 강원도 일대의 이 같은 설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눈발이 소나무를 비껴 흩날린다. 때론 휘모리바람에 눈이 공중을 부양하기도 한다. 이즈음 산중 설경이다. 사진작가 권부문(56)은 속초에 머물며 강원도 일대의 이 같은 설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하나의 원칙은 관찰자의 시점이 아닌 그곳에 들어가 노니는 것이다. 전통 산수화의 ‘와유’정신을 구현하고 싶었다.” 그는 설산 속에서 하루종일 머물며 작업을 했다. 카메라 장비는 물론 그마저도 눈속에 덮여 설경이 됐다.
현대 사진기술로 인화할 수 있는 가장 긴 길이라는 가로 5m 길이의 대형화면에 자연 그 자체를 명징하게 담아낸 사진은 선명한 세부(디테일) 때문인지 작가가 마주했던 ‘바로 그 풍경’을 가져다 놓은 듯하다. 아니 바로 눈을 맞고 있는 착각에 빠져들게 된다. 눈발의 스침과 부유하는 모습은 붓질 같은 질감마저 준다.
“요즘은 이미지만 가지고 인식하는 시대다. 체험 부재의 시대에 이미지를 체험의 단계로 끌어가야 한다.”
산세가 힘차게 굽이쳐 끝나는 지점에 우뚝 선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 그의 작품은 중국 북송 때의 화가 곽희의 산수화를 닮았다. “감성유전자의 우연한 일치다. 곽희도는 산수화를 사생적인 산수에서 마음속 산수로 끌어올린 인물이다.”
눈발이 흩날리는 눈덮인 모래사장과 낙산 앞바다를 함께 담은 작품은 얼핏 보면 회화 같다. 산수 연작은 수묵산수화 같고 낙산 연작은 정교한 데생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물론 회화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산수화 장르가 아닌 산수화 역사에서 대상을 대하는 태도를 취하고 싶다.”
그는 사진에 메시지 담기를 거부한다. “사진의 재현기능에 충실하고 싶다. 사진이 사회적 이슈에 너무 치중해 사진사가 바로 사회사가 되는 경우를 피해야 한다.” 그대로의 대상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는 그는 메시지를 집어넣고 여러 기술을 이용해 화려하게 포장하는 오늘날의 사진 작업들에 대해 우려했다.
“유행의 최전선엔 한 사람만 필요해요. 모두가 거기에 몰려가는 것은 들러리가 되기 십상이지요.” 12일∼2월27일 학고재. (02)720-1524
편완식 선임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젤렌스키는 독재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0/128/20250220522470.jpg
)
![[기자가만난세상] 불편한(?) 지진 재난문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395.jpg
)
![[세계와우리]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1/128/20240321519850.jpg
)
![[강영숙의이매진] 미술관이 학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128/202502065202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