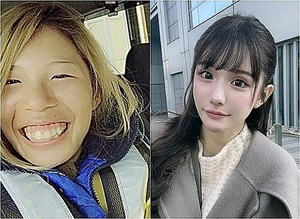왜 지금일까.
세계적인 감염병은 시시때때로 창궐했다. 2000년대 들어서만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신종플루(H1N1),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있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따지면 5년에 한 번꼴이다.
그때마다 경제가 휘청였지만, 비대면 산업을 육성한다거나 그린뉴딜로 위기를 넘자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왜 지금일까.

우선 바이러스의 특성에 그 이유가 있다.
신종플루는 2009년 봄부터 약 1년 반이나 이어졌지만 치료제가 있었고, 메르스는 아직까지 치료제나 백신이 없지만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 감염 사례가 수천 건 정도다. 이에 비해 코로나19는 치료제가 없고 전파도 빨라 확실히 공포스럽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비대면의 부상을 설명하기엔 어쩐지 부족한 느낌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신종플루는 치료제가 있었음에도 15만∼57만명의 희생자를 낳았고, 메르스의 치사율은 20∼30%나 되기 때문이다.
‘왜 지금인가’에 대한 또 다른 대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 메르스가 한국을 덮친 2015년을 떠올려 보자. 그때도 이미 스마트폰 보급률은 80%를 넘겼지만 지금 우리에게 일상이 된 배달앱이나 새벽배송, 모바일 결제 서비스는 아직 좀 낯설었다.
배달의민족 월 주문 건수는 지금의 15% 수준이었고, 삼성페이나 네이버페이, 토스, 사이렌오더, 마켓컬리, 왓챠플레이 등도 이제 막 서비스를 시작했거나 등장하기 전이었다.
불과 5년 사이에 어지간한 일상생활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왔고, 은행이나 마트에 가지 않아도, 매장직원에게 말을 걸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열렸다.
이전까지는 비대면으로 살아갈 기술도, 아이디어도 없었다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여가와 일,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가 터졌으니, ‘바로 저게 답이다’라는 좌표를 찍고 달려갈 곳이 생긴 것이다.
그린뉴딜이 늦게나마 한국형 뉴딜에 올라탄 배경에도 ‘달라진 세상’이 있다. 기후변화를 보는 눈이다. 산업혁명 이래 지구는 조금씩 달궈졌지만, 그 위기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게 된 건 최근의 일이다.
2018년 영국의 멸종저항 운동부터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등장이 있었고, 유럽연합과 미국에서는 각각 그린딜과 그린뉴딜을 추진 중이다. 이제 환경은 도의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기술개발과 제도개선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경쟁하기 어려운, 다시 말해 ‘먹고사는 문제’가 됐다.
물론 그린뉴딜 또한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처럼 토목사업을 합리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환경·시민단체의 줄기찬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싶다.
비대면 산업과 그린 뉴딜이 화두로 떠오른 2020년은 신종플루와 메르스가 돌던 10년 전,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과제들이 진영논리에 휩쓸려 표류하지 않기를 바란다.
윤지로 특별기획취재팀 차장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의협 회장 탄핵 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67.jpg
)
![[기자가만난세상] 美 애틀랜타 교포가 기 펴는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13.jpg
)
![[세계와우리] 北의 우크라戰 참전, 방관할 수 없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63.jpg
)
![[조경란의얇은소설] 이게 다는 아닐 거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2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