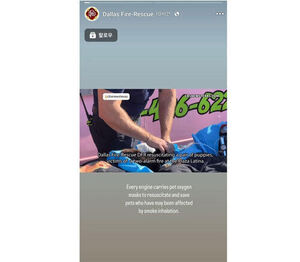매월당 김시습은 공부에 열중하던 중 삼각산 중흥사에서 세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3일간 문을 걸어잠그고 나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문을 박살내고 나와서는 서책을 모두 불살라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똥오줌을 온몸에 뒤집어썼다.
 |
| 강원도 철원 복계산에 있는 매월대 폭포. 폭포의 소리는 존재의 전체소리로 들리면서 매월당을 깨달음으로 인도했다. ‘차의 세계’ 제공 |
매월당이 방랑걸식 하다가 이곳에 은거하자 주민들이 풍광이 가장 빼어난 곳에 그의 호를 붙였다. 복계산 기슭(595m)에 위치한 높이 40m의 깎아 세운 듯한 층층절벽이 바로 매월대다. 이곳에 시원스레 하얀 폭포가 용트림하고 있다. ‘아홉 선비가 매월대에서 바둑판을 새겨놓고 바둑을 두었다’는 전설도 있다. 이 전설도 매월당과 관련되어 증폭되었을 것이다.
불가에서는 예로부터 폭포가 깨달음의 장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실지로 물(水)이야말로 생명과 존재의 근원에 가장 가깝다. 폭포 소리는 존재의 전체성과 관련이 깊다. 소리는 물성의 전체를 담고 있으면서도 사람의 몸 전체를 울리는 감각이다. 말하자면 파동의 우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매체가 물이고, 특히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다. 매월당에게 물과 차는 깨달음을 나타내는 두 기둥이다.
매월당은 완벽한 차인이었다. 이 말은 매월당이 차의 재배에서 시음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을 취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선비는 차를 재배하기보다는 음차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는 차를 직접 재배하고 볶아서 마셨으니 다산(茶山)이나 초의(草衣)의 전범이 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차시를 보면서 매월당, 청한자를 떠올려보자.
“집 북쪽에 차 심어 하얀 날을 보내고/ 산 남쪽에서 약을 캐며 푸른 봄을 지나네.”(千字麗句·천자여구)
산에서 은거하는 도인의 전형적인 생활 모습을 이렇게 간명하게 표현한 시도 드물 것이다. 산 생활이 몸에 밴 것을 알 수 있다. 백일(白日)은 백일몽과도 통하는 메타포이고, 청춘(靑春)도 영원한 푸름을 연상시키는 메타포이다. 차는 그에게 유일한 위로처럼 보인다.
“오늘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작은 솥에 차 끓이며 굽은 연못 바라보네./ 홀연히 고요 속에 삶의 의미가 동함을 기뻐하네/ 산바람이 불어 계화가지를 꺾어놓았네// 세간에선 안락을 청복으로 삼지만/ 난 차 달이며 평상에 앉았다네.” (山居集句·산거집구)
바로 무사(無事)의 경지이다. 이 시는 차를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차인이 도달하는 경지가 어떤가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는 삶의 의미가 몸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알고, 차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도와주는 영매이다. 그러나 한 편에선 산바람이 불어 계화의 가지를 꺾는 것을 본다. 자연의 생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사람들은 안락함을 찾지만 그는 차를 달이면서 살고 유유자적하고 있음을 뽐낸다. 자연과 혼연일체가 되어 기뻐하고 있음을 표현한다.
특히 이 구절 ‘홀연히 고요 속에 삶의 의미가 동함을 기뻐하네’(忽喜靜中生意動)는 차인의 절정의 경지이다. 매월당에게 차는 바로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차를 통해 그는 세파의 골육상쟁의 허무함과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달랬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한 개의 긴 정자일 뿐인데/ 어찌 동서가 있다고 내 생각하리.”(赴程還山·부정환산)
위의 구절은 매월당의 우주관의 광대무변함을 간명한 이미지즘으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한 정자에 머물다가 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차인이라면 이 정도의 경지에 도달하여야 ‘차(茶)의 도(道)’에 도달하였다고 해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내 보현사로 오고부터/ 마음도 한가롭고 편해/ 돌솥에 새 차 달이니/ 탕관에 푸른 연기 피네./ 나 방외인(方外人)으로서/ 세속 밖의 스님 따라 논다네.”(普賢寺·보현사)
매월당은 출가한 뒤 설잠으로 통했다. 유독 선사들과 친분이 두터웠다. 그는 스님 생활을 하면서도 한시라도 차를 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차를 선보다 앞세운 인물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언제나 차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짬이 나면 하시라도 차를 꺼내 달일 준비가 된 사람이다. 차선일미를 실천한 모습이다. 차는 그의 삶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차선(茶仙)이나 차신(茶神)에 어울리는 인물이다. 학이라는 것은 신선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다. 학은 하늘과 연결되고 이미지이고, 땅에서는 절구 소리가 나니 구름(하늘)이 조응한다. 그가 신선이 되게 하는 것은 차 끓이는 연기이다. 이 시는 신선인 자신이 땅에 머무른 것을 은유하고 있다.
“운산(雲山)과 화월(花月)을 오래 짝하며/ 시주(詩酒)와 향차(香茶)로 근심 달래네./ 촛불 돋우며 밤늦도록 차 마시니 맑은 밤 길어지고/ 근심 사라지니 밤이 짧도록 밤새도록 즐긴다네.”(南山七休·남산칠휴)
휴(休)자는 쉰다는 뜻도 있지만 아름답다는 뜻도 있다. 경주 남산에서 은거하면서 구름, 산, 꽃, 달, 시, 술, 차는 일곱 가지 아름다움이다.
“생애를 점검해도 구속될 것 하나 없고/ 한 솥의 햇차와 한 줄기 타고 있는 향뿐이네.”(雨後·우후)
그의 생애가 얼마나 담백하고 소박한가를 증명하고 있는 시이다. 그런데 한 솥의 햇차, 한 줄기의 향이 전부라니 진정 ‘구속될 수 없는 자유인’인 것이다. 이에 비하면 차옥이나 다관에서 인공 정원을 지나면서 와비차라는 것을 즐기는 것이 ‘박제된 초암’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서는 상 위에 흩어져 있고/ 권질은 어지럽네./ 질화로엔 향내 나는 연기 일고/ 돌솥엔 차유가 울고 있네.”(耽睡·탐수)
 |
| 매월당은 즐겨 솔방울을 피워 차를 달였다고 한다. 한번 불이 붙으면 화력이 좋기 때문이다. ‘차의 세계’ 제공 |
차는 좋은 물로 잘 끓여야 좋은 차 맛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옛 차인들은 물이 끓는 정도를 거품이 이는 모양, 김이 나는 품새, 물이 끓는 소리 등으로 가늠했다. 청한자 김시습의 차시가 한 수 떠올랐다.
“솔바람 솔솔 불어 차 끓이는 연기 몰아/ 하늘하늘 흩날리며 시냇가에 떨어지네./ 동창에 달 떠도 잠 못 이루고/ 병들고 돌아가 차디찬 샘물 긷네// 세속 싫어하는 천성 스스로도 이상하지만/ 문에 봉(鳳)자 쓴 일 이미 청춘이 갔네/ 차 끓이는 누런 잎 그대는 아는가/ 시 쓰다 숨어 삶이 누설될까 두렵네”(煮茶·자다)
수많은 시와 글을 남긴 매월당은 항상 책에 파묻혀 살았을 것이다. 자유로이 흩어진 서책들, 그 옆에는 항상 차가 끓고 있다. 불과 물과 소리가 어우러지는 오수(午睡)의 시간, 누가 졸고 있는 광경은 평화 그 자체이다. 다도가 추구하는 평화와 정적과 안락이 한데 어울러져 있는 모습이다.
“늙은이들 하릴없이 화롯가에 둘러앉아/ 도공의 차 한 잔을 달여서 마신다네.”(看雪·간설)
늙은이는 노숙(老熟)을 나타내고, 도공(陶工)의 차(茶)는 어딘가 도연(陶然)한 인생의 경지를 은유하고 있는 것 같다. 하나같이 초탈과 완숙의 연속이다.
“새벽 해 떠오를 때 금빛 전각 빛나고/ 차 연기 흩날리는 곳엔 서린 용이 비상하네./ 맑고 한가로운 곳에 노닐면서/ 세상의 영욕 모두 잊었다네.”(長安寺·장안사)
일출이 만들어내는 자연의 금빛 전각에 어울려 차를 끓이는 연기가 하늘로 오르는 모양이 마치 용이 비천하는 것 같다. 자연의 모습에서 우화등선(羽化登仙)하는 상상을 하니 바로 신선의 세계이다.
“등잔 아래 차 끓는 소리 오열하고/ 꼿꼿이 앉은 모습 나무등걸 같구나./ 이 몸이 마치 물거품 같은데/이 그림자 끝내 멍청하구나.”(燈下·등하)
희미한 등잔 아래 차가 끓고 있고, 그 옆에 조용히 좌선하는 선사의 모습이 나무등걸 같다. 이 몸은 이미 환영의 포말처럼 탈혼이 되어 우주를 자유로이 왕래하건만 그림자는 이것을 모르고, 멍청하게 자신을 분칠하고 있다.
문화평론가 pjjdisco@naver.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멕시코만(灣)을 미국만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747.jpg
)
![[기자가만난세상] 전통예술 생태계 사라지게 둘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09/128/20170709507884.jpg
)
![[삶과문화] 총알은 틀림없이 발사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568.jpg
)
![[맹수진의시네마포커스] 애니멀 킹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6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