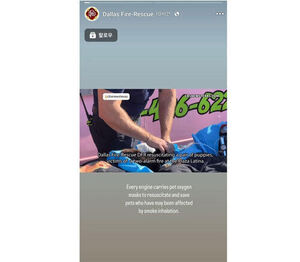민주주의 역사는 조세 저항과 궤를 같이한다. 1215년 영국의 대헌장과 1689년 권리장전, 1776년 미국의 독립전쟁이 단적인 예다. ‘가혹하게 털 뽑힌 거위들의 반란’이라고 불리는 1789년 프랑스혁명도 대표적인 조세 저항 운동이다.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세금 없는 국가 역시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하나로 불리는 토머스 제퍼슨은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라는 명언까지 남겼다.
문제는 공평성이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억울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억원짜리 아파트와 5억원짜리 아파트에 부과하는 세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자동차세는 예외다. 1967년 지방세법에 자동차 세목이 도입된 이후 배기량 기준 부과 방식이 56년째 유지되고 있다. 초기 일부 차량에만 차등부과하던 것이 1991년에는 전체 차량으로 확대됐다. 한때 자가용 보유 여부가 학교 호구조사 항목이었을 정도로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었다. 배기량이 많은 차가 가격이 비싼 데다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 이유도 고려됐다. 차종별로 감가상각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많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전기차 등의 등장으로 배기량과 차값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상관성이 떨어졌다. 현재 자동차세는 영업용은 cc당 18~24원, 비영업용은 80~200원을 부과한다. 전기·수소차는 정액 13만원(자동차세 10만원+지방교육세 30%)만 부과한다. 비싼 전기차·수입차가 국산차보다 세금이 적은 역진성이 일어난 지 오래다. 감가상각을 반영해 출시 후 매년 5%씩 할인해 최대 50%를 감면해주는 것도 환경보호라는 취지와 어긋난다.
정부가 이달 중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배기량 기준 일률적 부과방식의 개선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2030년 누적 보급 420만대에 달하는 전기차도 변수다. 벌써부터 혼합형(가격·탄소 배출량 조합)이니 무게기준(전기차)이니 하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2015년에도 개정안이 발의됐었지만 흐지부지됐다. 이번만큼은 합리적 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멕시코만(灣)을 미국만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747.jpg
)
![[기자가만난세상] 전통예술 생태계 사라지게 둘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09/128/20170709507884.jpg
)
![[삶과문화] 총알은 틀림없이 발사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568.jpg
)
![[맹수진의시네마포커스] 애니멀 킹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6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