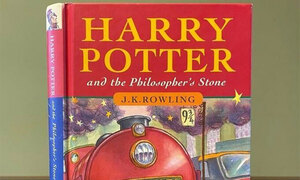우리가 잘 아는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이 동화 제목을 두고 강성곤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초빙교수는 “누군가의 초라한 언어 감수성이 빚어낸 비극적 결과”라고 지적한다. 이어 “‘미운 새끼 오리’였어야 한다. 단어의 위치 잡기가 이토록 막중하다. 관성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에 따르면 강아지와 생쥐, 송아지처럼 새끼 형태의 낱말이 따로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단어 ‘새끼”를 그 동물 명칭의 앞에 놓아야 안정적이고 편안하다. 중립적·객관적 용어일 때는 ‘새끼 사슴’, 새끼 호랑이’ 등으로, 문화적·감성적으로 표기해야 할 경우는 ‘아기 곰’, ‘아기 코끼리’ 등 형태로, 어류일 때는 어린 물고기처럼 ‘어린’을 붙여 쓰면 유용하다. ‘새끼 멸치’보다 ‘어린 멸치’가 딱 들어맞는다.
강 초빙교수는 우리말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사람 중 하나다. 37년간 공영방송(KBS)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KBS한국어능력시험 출제 및 검수위원,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강사 등을 지낸 이력에서도 잘 드러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 특위 활동을 하면서 방송미디어의 외래어·외국어 남용,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표현,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표현, 자막 오류, 비속한 표현 실태 등을 면밀히 관찰하기도 했다. 건강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언어 생활에 문제의식이 많은 그가 올해 펴낸 ‘정확한 말 세련된 말 배려의 말’(노르웨이 숲)은 정확하거나 세련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언어 생활 사례를 제시하며 왜,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책 내용 중, 어떤 종류의 차별에도 민감한 시대 변화에 맞춰 ‘공정하게 말하는 법-차별하지 않는 중립적 표현’에 소개된 대목을 일부 정리해 소개한다.
#‘내외빈(內外賓)’, ‘내외 귀빈(貴賓)’ 표현 자제해야
‘내빈(來賓)’은 ‘초대해 응해 온 손님’을 말해서 ‘내외빈’은 적절치 않다. 그냥 내빈이다. 일각에서 “사내에 높은 분과 밖에서 오신 분을 구분하고자 할 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기를 들 수 있는데 억지다. 회사 내 높은 분(사장·이사·감사 등)들이 손님인가. 직원과 함께 회사를 이끌어가는 주인 아니던가. ‘내외 귀빈’도 부적절하다. 이들이 귀빈이면 보통 참석자는 평민이나 천민인가. 시대착오적인 표현을 답습하지 않도록 하자.
# 사사, 자문, 임대료 바르게 써야
‘사사(師事)하다’ 자체가 ‘스승으로 섬기다’,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다’라는 뜻이다. 따라사 ‘사사 받다’가 아니라 ‘사사하다’로 써야 옳다. ‘자문을 구하다’도 마찬가지다. ‘자문(諮問)하다’가 ‘어떤 일을 좀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다’란 뜻이다. 그러므로 ‘자문하다’, ‘조언을 구하다’ 정도로 쓰자. 같은 맥락에서 ‘자문위원’이란 표현도 ‘전문위원’이 나을 듯하다.
‘분리수거’를 요즘은 ‘분리배출’로 쓰듯 ‘임대료’도 ‘임차료’로 바꾸어야 한다. ‘임대료’나 ‘분리수거’는 아마도 오래 전 고위관료나 법조인들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면서 갑(甲)의 입장에서 별 생각없이 공공언어화했을 것이다. 바야흐로 관(官)보다 민(民)의 시대다. 그 맥락의 일환이다.
# 귀성(歸省)길→고향길, 귀경(歸京)길→귀갓길
성(省)은 산둥성, 후난성처럼 중국의 지방 행정 단위다. 이 흔적이 남아 일본의 정부 조직도 외무성(외무부), 방위성(국방부)처럼 성이다. 하지만 성은 한국인에게 익숙하지 않다. ‘귀성길’을 사전에서 보면 ‘객지에 나가 있다가 부모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설명하는데, 성의 본래 실체는 빼고 그저 좋게만 풀이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귀성길은 ‘고향길’로, 귀성객은 ‘고향 찾는 시민’ 등으로 쓸 때가 됐다.
마찬가지로 귀경도 언짢다. 고향 갔다가 모두 서울로 오는가? 인천 시민, 경기 도민은? 서울이 경성(京城)이 아니라 서울인 것은 중국, 일본과 구별되는 우리 독자성, 독립성의 아름다운 구현이다. 그저 ‘귀갓길’이면 족하다. ‘귀경 차량·행렬’도 ‘귀가 차량·행렬’ 등으로 쓰자.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은 더 큰 문제다. 지역 차별이다. 지리적 위치가 남쪽에 있다고 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서울(수도)을 어떻든 ‘올라가는’ 우월적 위치로 치부하게 돼 그렇다. 서울에서 강화, 김포, 파주, 춘천, 강릉 등으로 가는 가족들을 보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잖은가.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사우디 왕세자 ‘Mb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500.jpg
)
![[기자가만난세상] 600살 대왕소나무의 죽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395.jpg
)
![[세계와우리] ‘전략적 황금기’ 北… 韓의 준비태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10/31/128/20241031521263.jpg
)
![[성백유의스포츠속이야기] 韓 쇼트트랙의 아픔, 린샤오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632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