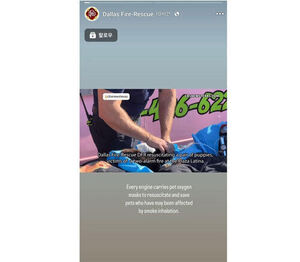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우리나라에서 로스쿨 도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었고(참여정부 주연, 한나라당 조연, 국민 관객의 영화였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로스쿨의 비극이다. 우리 모두가 패자다.”
한국형 로스쿨법이 2007년 7월3일 자정 국회를 통과한 이듬해인 2008년, 서울대 법대 이용식 교수가 ‘현대형법이론’ 서문을 통해 펼친 주장이다.

16년이 지난 지금, 그의 비판은 과연 기우에 그쳤을까. 법학 교육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배출하겠다던 로스쿨 도입 취지는 달성됐을까. 안타깝게도 실무계와 학계에서는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강대 로스쿨 왕상한 원장은 지난해 말 법률신문 인터뷰에서 “로스쿨이 출범했을 때 내세웠던 취지, 명분이 모두 사라졌다”면서 “학생, 학교, 변호사, 법률서비스 소비자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돈을 긁어모으면서 증원에 반대하는 이기적인 의사들의 밥그릇 투쟁” 이전에 법조인들이 있었다. 사법고시라는 바늘 구멍을 뚫은 그들은 돈과 권력을 양 손에 거머쥔 권위적인 기득권으로 여겨졌다. 로스쿨 도입의 명분은 변호사 숫자를 대폭 늘려 국민의 사법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하자는 것이었지만 이면에는 기득권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한 법조인은 “실제로는 변호사 배출 인원을 늘려서 개업 변호사들의 평균 소득수준을 낮추자는 것이 당시 노무현정부의 속마음이었다는 게 법조계 내 공공연했던 얘기”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로스쿨 도입이 전체 변호사들의 평균 소득수준을 깎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뿐이다. 왕 원장은 “제대로 된 변호사가 늘어나야 하는데 로스쿨 교육 3년으로 수준 높은 법조인을 양성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변호사 숫자가 늘어났다고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사회에 공급되는 게 아니다”고 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의정 갈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 대통령은 “일단 숫자를 늘려야 한다”면서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늘려)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니 사회 모든 분야에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다 자리 잡아 우리나라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법치주의 발전을 체감하는 국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는 것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도 없는 것 같다.
의대 정원 확대의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특정 집단을 ‘악(惡)’으로 상정하고, 이를 타파하는 개혁은 ‘선(善)’으로 규정 짓는 프레임은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흑백논리 오류에 빠지기 쉽다. 더욱이 실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한 채 몰아붙이는 ‘귀틀막(귀를 틀어 막은)’ 개혁은 끝내 우리 모두를 패자로 만들 위험이 높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개혁을 통해서도 이를 목도했다. 수사 전문가인 검사들의 우려와 비판을 ‘검사들의 기득권 지키기’로만 몰아세웠던 검수완박 개혁의 결과는 어떠했던가. 누구보다 윤 대통령이 가장 잘 알고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멕시코만(灣)을 미국만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747.jpg
)
![[기자가만난세상] 전통예술 생태계 사라지게 둘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09/128/20170709507884.jpg
)
![[삶과문화] 총알은 틀림없이 발사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568.jpg
)
![[맹수진의시네마포커스] 애니멀 킹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6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