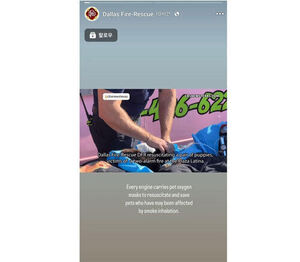물 있는 곳서 문명 꽃피운 인류처럼
제주 ‘용천수’ 상징적 의미 담아 건립
문학관 옆 숲에 ‘큰물 마당’ 만들고
탁 트인 유리벽으로 1층 경계 허물어
고사리·현무암… 제주 식생정원 눈길
자연·민속·언어 ‘三寶’ 오롯이 드러내
인간은 무리를 이루며 살아간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리를 이루기 위한 최초의 매개체는 물이나 식량 같은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다. 마을과 동네를 뜻하는 한자 ‘洞(동)’을 통해 ‘무리(同)’를 이루기 위한 매개체로 ‘물(?)’의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보다 규모가 큰 고을을 의미하는 한자 ‘州(주)’는 거주자들이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천(川) 변에 고을이 있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일깨워 준다.
그런데 구멍이 송송 뚫린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제주에서는 우물이나 하천을 통해 물을 얻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빗물을 모은 봉천수(奉天水)와 지하수가 땅 위로 솟아 나오는 용천수(湧泉水)를 생활용수로 사용해 왔다. 1970년대 지하수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용천수 사용이 줄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제주도 내 646곳의 용천수 중 162곳이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 보완계획’(2021),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제주에서는 용천수를 ‘큰물’이라고 부른다. 제주 사람들은 큰물이 나오는 곳을 식별하기 위해 그 주변에 돌담을 쌓았는데, 어떤 돌담은 물의 용도를 구분하거나 남녀가 씻는 장소를 나누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큰물 주변에 쌓은 돌담은 각져 있기보다는 대부분 주변 지형을 따라 불규칙한 곡선을 이룬다. 그래서 큰물과 그 주변의 돌담을 보고 있으면 제주 사람들의 삶과 풍경이 형상화된 것 같다.
물이 있는 곳에서 인류는 문명과 문화를 꽃피웠다. 그리고 그 형태 중 하나가 문학이다. 제주도 마찬가지였다. 큰물에 모여 빨래와 식사 준비, 그리고 목욕을 하면서 이웃들과 나누던 대화가 문학의 소재가 됐다. 가끔 말재주가 있는 사람의 허풍은 이야기에 극적인 요소를 더해 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주문학관을 설계한 조정구는 “제주 사람들의 이야기가 피어나는 문학의 원천으로 큰물이라는 공간의 실체와 상징성에 주목했다(구가건축 홈페이지).”
문제는 제주문학관 건립부지에는 큰물이 없다. 서쪽으로 한천이 지나가지만 숲이 있어서 쉽게 인지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한천은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는 건천이다. 결국 설계자는 북쪽에 있는 숲 옆에 외부공간으로 큰물을 닮은 큰물마당을 만들었다. 그리고 문학관 1층에 있는 로비와 북카페에서 제주 문학을 읽는 방문객들이 제주 문학의 원천인 큰물마당을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건축가는 특별한 네 가지 시도를 했다.

가장 먼저 문학관 1층을 탁 트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책장은 허리 높이 아래로 맞췄고 의자는 등받이가 없거나 낮은 것을 골랐다. 무엇보다 천장과 바닥을 연결하는 기둥과 같은 구조체를 하나도 두지 않았는데, 이는 2층에 있는 철골철근콘크리트 트러스(SRC Truss)로 해결했다. 4층부터 내려오는 하중을 2층의 트러스가 1층 양쪽 끝으로 전달하고 이를 큰물마당을 둘러싼 돌담이 떠받치는 원리다.
둘째는 1층 천장을 매끈하게 처리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천장에는 상층 슬래브의 하중을 기둥으로 전달하는 보(Beam)가 놓이고 그 사이에 천장형 에어컨과 같은 공조 장치나 조명기구가 설치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천장이 어수선해지고 층고가 낮아져 시야가 눌린다. 제주문학관에서 설계자는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1층 천장 아래에 배치되어야 하는 보를 2층 바닥에 설치하는 ‘역보’ 구조를 적용했다.
셋째는 1층 바닥을 문학관 입구로 들어와 큰물마당으로 나가는 문까지 점차 낮아지게 했다. 그래서 로비와 북카페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은 다양한 높이에서 큰물마당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큰물마당을 나갈 때까지 시야가 점차적으로 터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넷째는 문학관 1층의 내외부 경계를 느낄 수 없도록 유리벽과 가까운 바닥에 고사리와 현무암 등 제주의 식생을 활용한 실내 정원을 조성했다. 마치 문학관 밖에 있는 자연이 건물 안으로 스며들어 온 것 같은 실내 정원 때문에 유리벽 안팎이 연결된 듯한 착각이 든다.

제주문학관의 형태는 한 변의 길이가 25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을 평면으로 하는 육면체다. 건축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이지만 네 면은 입면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다. 마치 문학의 표현 수단은 ‘언어’ 한 가지이지만 어떤 맥락을 마주하느냐에 따라 시가, 가사, 소설, 희곡 등 다양한 갈래로 나뉘는 상황과 비슷하다.
왕복 6차로의 연북로에 면한 남쪽 입면은 각층이 다른데, 도로에 가까운 2층은 폐쇄적이지만 3층은 수직 창틀, 4층은 한라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리 패널이 설치돼 있다. 문학관 안에서 주변의 자연과 멀리 한라산 등 제주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풍경 속의 문학관”이라는 설계자의 설명이 와 닿는다.
문학은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부대끼고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경로다. 그렇기에 지역에 들어서는 문학관이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외지인이 아닌 현지 거주자들이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학가들이 지역문학관을 짓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제주문학관도 2005년 추진위원회가 처음 구성되고 8년 후 문학인과 지역 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됐다. 최종적으로 2019년에 개관됐다. 문학관에는 창작공간, 문학살롱, 소모임공간, 세미나실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더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학관 2층에 마련된 상설전시실을 둘러보다 ‘바당문학’과 ‘해녀문학’, 그리고 ‘4.3문학’ 섹션에 눈길이 갔다. ‘바당’은 바다의 제주 사투리다. ‘바다’와 ‘해녀’는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 ‘민속’이다. 그리고 ‘4.3’은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의 아픈 기억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를 ‘삼다(三多)도’와 ‘삼무(三無)도’로 알고 있다. 그런데 제주에는 ‘삼보(三寶)’도 있다. 세 가지 보물 중 두 가지는 ‘자연’과 ‘민속’이다. 그리고 남은 하나는 바람이 많이 부는 제주의 풍토가 만들어낸 특별한 ‘언어’다. 제주문학관은 제주의 언어로 제주의 자연과 민속을 표현하고 있는 문학을 담고 있는 집이다. 그래서 제주의 보물함이다.
방승환 도시건축작가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멕시코만(灣)을 미국만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747.jpg
)
![[기자가만난세상] 전통예술 생태계 사라지게 둘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09/128/20170709507884.jpg
)
![[삶과문화] 총알은 틀림없이 발사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568.jpg
)
![[맹수진의시네마포커스] 애니멀 킹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6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