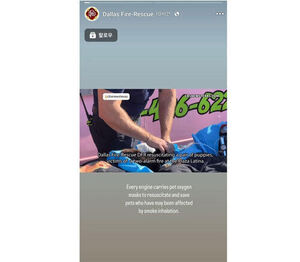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여성에게만 보살핌 부담…한국도 저출산 겪어”
“노동력 확보와 국가 성장을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저출산을 심화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일본의 한 인구학자가 사회와 조직 유지의 관점에서 육아 지원 대책을 마련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구학 박사이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부소장을 지낸 가네코 류이치 메이지대 특임교수는 3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출산율이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주민투표’와 같은 것이라고 했다.
가네코 교수는 “사회와 지역에서 인생이 유감스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아이를 가질 의욕이 작을 것”이라며 “출산율은 사람들의 사회에 대한 지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겪었다. 지난해 일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1.2명으로 1947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전체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6% 감소한 72만7000여 명이었다.
가네코 교수는 저출산 대책을 수립할 때 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정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육아휴직 보상, 아동수당, 교육 무상화 등 정책을 내놓아도 10년, 20년 뒤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아이를 낳아 기르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응변식 정책에 자신과 아이의 인생을 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대책 효과는 정책을 결정한 정치가가 퇴장할 때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 시스템과는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네코 교수는 일본에서 저출산이 심각해진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극단적으로 경제 활동을 우선시한 현대사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가사, 육아, 병간호 등 보살핌 활동은 개인적 영역으로 인식돼 공적 영역으로부터 분리돼 낮게 취급됐다”며 “남녀 역할 분업 속에서 여성에게만 보살핌의 부담을 강요하는 구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가네코 교수는 서구보다 근대화에 늦어 압축적 근대화를 경험한 한국과 중국도 일본처럼 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저출산·고령화는 근대화에 수반되는 필연적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류가 존립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과 환경 문제가 비슷한 측면이 있다면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모든 지자체가 살아남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가네코 교수는 “전체 파이(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모든 지자체가 활성화 뿐만 아니라 책임 있게 소멸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멕시코만(灣)을 미국만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747.jpg
)
![[기자가만난세상] 전통예술 생태계 사라지게 둘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09/128/20170709507884.jpg
)
![[삶과문화] 총알은 틀림없이 발사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568.jpg
)
![[맹수진의시네마포커스] 애니멀 킹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6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