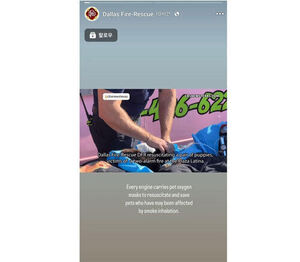세계 최초의 전기차는 1881년 프랑스의 발명가 귀스타브 트루베(Gustave Trouvé)가 발명한 삼륜 자동차다. 지금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 시내에서 주행시험도 했다. 납축전지와 전기모터를 세발자전거에 접목한 것으로 일종의 프로토타입(시제품)이었다. 이후 영국의 토머스 파커(Thomas Parker)가 1894년 세계 최초의 양산형 4륜 전기차 개발에 성공했다. 전기차는 물 끓이느라 상당시간을 허비했던 증기자동차, 시동을 걸기 위해 크랭크를 돌리고 복잡한 기어 변속이 필요한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편리했다. 덕택에 20세기 초까지 미국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30% 가량은 전기 자동차였다.
1920년대를 전후해 전기차는 몰락의 길을 걷는다. 무겁고 거추장스런 납축전지 성능이 그저 그랬다. 충전 속도가 느리고 충전 기반시설은 부족했다. 오늘날 국제 유가 지표로 삼는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가 채굴돼 값싼 휘발유가 보급되자 퇴출이 앞당겨졌다. 미국 포드사의 ‘모델T’ 등장으로 가솔린엔진 자동차가 시장지배력을 키운 것도 이를 부추겼다. 1930년대 접어들며 전기차는 아예 자취를 감췄다.
현대적 의미의 전기차는 2005년 이후 개발됐다. 내연기관 차량이 100년에 걸쳐 쌓아올린 성능을 10년이 채 안 돼 추월했다. 2012년 출시돼 자동차 시장 판도를 바꾼 테슬라의 ‘모델S’는 이정표다. 여기에 2015년 독일 폭스바겐그룹 디젤게이트 사건과 이로 인한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전 세계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에 사망선고나 다름없었다.
반대로 전기차는 소비자에게 친환경의 대명사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굴지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너도나도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었다. 최근 전기차가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침체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다. 그렇더라도 전기차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종식시키고 미래 모빌리티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전망은 여전하다.
복병은 있다. 얼마 전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자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고객센터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을 문의하는 전화가 빗발친다. 일부 소비자는 전기차 구매를 포기하거나 보유한 전기차를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내 논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파트마다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하는 등 갈등도 계속된다. 전기차 산업계 전체가 심각한 침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반등의 계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개선 여하에 달려 있다. 폭발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전고체 배터리가 대안으로 꼽힌다. ‘꿈의 배터리’로 불린다. 현재 생산되는 배터리는 액체 형태를 띤 전해질이 새어 나올 경우 발화 위험이 높다. 이를 고체로 대체하면 폭발과 화재 위험성을 줄이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다.
전고체는 양산이 쉽지 않다. 시장에 등장하는 시점이 빨라야 2027년쯤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20세기 초 전기차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데도 배터리 성능이 문제였다. 기시감이 들 수밖에 없다. 딱 100년전 일이다.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까. 전기차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멕시코만(灣)을 미국만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747.jpg
)
![[기자가만난세상] 전통예술 생태계 사라지게 둘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09/128/20170709507884.jpg
)
![[삶과문화] 총알은 틀림없이 발사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568.jpg
)
![[맹수진의시네마포커스] 애니멀 킹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6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