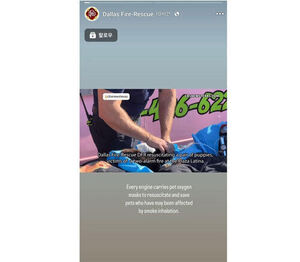삼촌은 기계를 잘 다뤘다 아픈 사람도 기계로 고쳤다
비가 오거나 스님이 시주를 오는 날이면 톱날을 교체하곤 했다
삼촌은 언제 뭉툭해졌더라
몇 번째 톱날이었더라
기계가 삼촌을 오랫동안 만지던 날
우리는 기름이 떠다니는
미숫가루를 마시며
철판을 옮겼다

수리공, 기계공 등의 뜻을 지닌 “메카닉(mechanic)”은 속어로 살인 청부업자를 이르기도 한다고. 당연히 시인은 이 모든 의미를 두루 염두에 두고 제목을 지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시에는 어떤 섬뜩함이 있다. “삼촌은 기계를 잘 다뤘다”로 시작해 “기계가 삼촌을 오랫동안” 만졌다에 이르는 과정은 섬뜩할 정도로 자연스럽다. 기계? 기계! 기계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대체로 잊고 살아간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깊이 기계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기계의 작은 부품으로서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다는 사실. 몇 번째 톱날로서, 몇 번째 톱날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영위하고 있다는 것. 일상은 그렇게 잘도 굴러간다. 어쩐지 마음이 약해지려 할 때마다 보란 듯 톱날을 교체하는 식으로.
우리는 다만 “기름이 떠다니는 미숫가루”를 마시며 하던 일을 계속할 뿐. 그것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영영 알지 못한 채.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겠지. 병이 들겠지. 쓸모없는 부품이 되어 몸져누우면 새 기계를 가져와 손을 볼 것이다. 어서 일어나자고, 일어나 하던 일을 계속하자고.
박소란 시인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멕시코만(灣)을 미국만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747.jpg
)
![[기자가만난세상] 전통예술 생태계 사라지게 둘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09/128/20170709507884.jpg
)
![[삶과문화] 총알은 틀림없이 발사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568.jpg
)
![[맹수진의시네마포커스] 애니멀 킹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6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