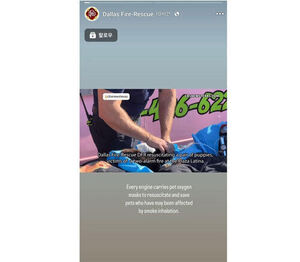1944년 프랑스가 4년여에 걸친 나치 독일의 점령에서 벗어나 해방됐을 때 레지스탕스 지도자이자 임시정부 수반인 샤를 드골이 프랑스 정권을 장악하는 건 시간문제처럼 보였다. 하지만 드골은 새로 제정된 프랑스 제4공화국 헌법에 실망해 정계를 떠났다. 4공화국 헌법은 앞선 3공화국 헌법을 거의 그대로 답습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했고 행정부 수반인 총리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의회가 총리 불신임권을 가진 만큼 원내에 확고한 과반 다수당이 없으면 총리와 그의 내각은 파리목숨이나 다름없었다. 드골은 제2차 세계대전 도중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만났을 때 그에게 들은 모욕적인 말을 떠올렸다. “프랑스는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어 그들 중 내가 기억하는 이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3공화국(1870∼1940)과 4공화국(1946∼1958)을 합쳐 82년간 내각이 무려 120번 넘게 교체됐다.

1958년 프랑스는 나라가 두 쪽 날 위기에 놓였다. 19세기 이후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때문이다. 1954년부터 알제리에선 독립을 원하는 저항군과 이를 막으려는 프랑스군 간의 전투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프랑스 국내 여론은 분열됐다. 좌파와 자유주의자들은 “제국주의는 끝났다”며 알제리 독립을 지지한 반면 군부와 강경 우파 세력은 “프랑스의 위신을 지켜야 한다”며 알제리가 프랑스 일부로 남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위기를 해결한 사람은 드골밖에 없다’는 여론이 확산하며 이미 오래 전에 정계를 떠난 드골이 프랑스 중앙 정치 무대로 소환됐다. 그는 승부수를 던졌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권을 맡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이러다가 프랑스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워낙 컸던 만큼 드골의 요청은 받아들여졌다.
이듬해인 1959년 마침내 프랑스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헌법 문구만 놓고 따지면 미국, 한국과 같은 대통령제에 가까웠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통령 밑에 상당한 권한을 갖는 총리가 존재하는 점, 총리는 의회의 불신임 대상이라는 점, 원내 과반 의원이 반대하는 인물은 결코 총리가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전통적인 대통령제와는 다르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원집정제 또는 반(半)대통령제라는 용어로 프랑스 정부 형태를 설명했다. 실제로 5공화국 출범 후 프랑스에선 여소야대 국면일 때 여당 지도자인 대통령과 야당 출신 총리가 공존하는 동거정부(cohabitation)가 출현하곤 했다. 1980∼1990년대 프랑스가 참여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나 양자 정상회담 등에 대통령과 총리 두 명이 대표로 나서는 이색적 풍경이 연출된 것도 그와 무관치 않다. 한때 “제법 괜찮다”는 평가를 들은 프랑스 정치제도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일 우파 공화당 소속 미셸 바르니에(73)를 새 총리로 지명했다. 바르니에는 과거 자크 시라크 대통령 밑에서 외교부 장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밑에서 농수산부 장관을 지낸 정계 거물이다. 문제는 그가 속한 공화당이 지난 7월 총선에서 의석수 기준으로 1당인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 2당인 중도 집권당, 3당인 극우 성향 국민연합(RN)에 이은 4당이란 점이다. 그간 “1당인 우리가 총리를 배출하고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온 NFP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NFP에 속한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선거에서 4위를 차지한 당의 인물이 총리가 됐다”며 “마크롱의 민주주의 부정이 극에 달했다”고 맹비난했다. 좌파가 원내 다수당이 된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우파 총리를 택한 마크롱의 결단이 ‘총선 민심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듣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바둑에 비유하면 마크롱의 다음 포석이 무엇일지 궁금하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멕시코만(灣)을 미국만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747.jpg
)
![[기자가만난세상] 전통예술 생태계 사라지게 둘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09/128/20170709507884.jpg
)
![[삶과문화] 총알은 틀림없이 발사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568.jpg
)
![[맹수진의시네마포커스] 애니멀 킹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6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