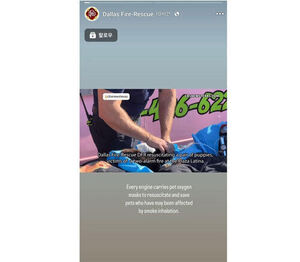1992년 10월 3일. ‘새터데이 나잇 라이브’에서 아일랜드 가수 시네이드 오코너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사진을 박박 찢어버렸을 때 그것은 세계를 경악시킨 스캔들이 되었다. 이후 밥 딜런 30주년 기념 공연에서 관객들의 야유로 도저히 노래를 끝까지 부를 수 없게 된 그녀는 무반주로 밥 말리의 ‘전쟁 war’를 부르고 내려와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린다.

한때 유럽에서 가장 신실한 가톨릭 국가로 여겨졌던 아일랜드 교계에 만연한 성폭력, 아동학대, 인권 침해를 공론화하는 트리거가 된 ‘막달레나 수녀원’, 일명 ‘막달레나 세탁소’ 사건은 2000년대 들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1922년부터 1996년까지 무려 74년간 권위 있는 종교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 유린의 실상은 2002년 영화 ‘막달레나 시스터즈’(피터 뮬란)에 의해 드러났고 영화 개봉 후에 즉위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식적으로 교회의 잘못을 인정해야 했다. 시네이드 오코너가 일찌감치 용기를 낸 데에는 어린 시절 막달레나 수녀원에서 자란 그녀의 사적 경험이 일정하게 작용했다고 한다.
2024년 베를린 영화제 개막작인 ‘이처럼 사소한 것들’(팀 밀란츠)은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세상에 소환한다. 클레어 키건의 동명 원작소설에 기초한 이 영화는 가톨릭 수녀회가 운영해온 막달레나 세탁소가 사실은 낙태 여성, 미혼모를 비롯한 여성들을 감금, 폭행하고 값싸게 노동력을 착취해온 감옥이자 수용소였다는 사실을 폭로한다. 영화를 보며 느끼는 아득한 절망감은 이 사건이 소수의 폭력이나 일탈이 아니라 교회를 구심점으로 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오랜 암묵적 용인과 외면, 은폐에 의해 가능했다는 점에 있다. 한나 아렌트가 ‘사고가 결여된 직무 수행, 자발적 순응’이라고 표현한 ‘악의 평범성’이 나치즘을 가능케 했던 것처럼 ‘악의 평범성’이라는 테마는 이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우연히 수녀원 창고에 갇힌 소녀를 발견한 빌에게는 압력이 가해진다. 그러나 그것은 총과 칼, 폭력을 앞세운 노골적인 압력이 아니다. 케이크와 차의 달콤함, 조용하고 나긋한 목소리를 한 침묵과 외면의 강요이다. 살기 위해 모른 척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며 넌지시 흘리는 미소를 띤 폭력. 그 외면의 대가는 두툼한 돈 봉투와 아이들의 안전이다. 카메라는 불투명한 창문 너머로 흔들리는 빌의 내면을 포착한다. 그는 매일 저녁 석탄 가루로 시커멓게 된 손을 박박 문지른다. 내일이면 다시 검게 변할 손을 매일 밤 피 흘리듯 닦아낸다.
오욕과 침묵, 범죄로 얼룩진 크리스마스이브의 세상은 흰 눈으로 뒤덮인다. 어둠에 침잠된 거리에는 우뚝 솟은 교회의 첨탑과 교회를 비추는 조명만이 빛난다. 영화는 시작할 때와 끝날 때 두 번의 교회 종소리를 들려준다. 초반에 우리는 그 종소리가 구원과 평화의 소리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화가 끝날 무렵 다시 종소리가 울릴 때 그것을 시작부에서 들은 종소리와 같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 이 종소리는 공동체의 지옥문을 여는 소리일까 닫는 소리일까? 이 영화에서 낙관은 언감생심이겠지만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 고통스럽지만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 우울한 크리스마스에 부여잡을 가느다란 희망을 놓고 싶지 않다.
맹수진 영화평론가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8/128/20250108522856.jpg
)
![[세계포럼] 국정 공백 속 책임 내던진 다수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6/30/128/20190630508230.jpg
)
![[세계타워] 실손보험, 사회 안전망 역할 유지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07/128/20240807524904.jpg
)
![[사이언스프리즘] 우리의 뇌는 무엇을 진실이라고 믿는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8/128/2025010851910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