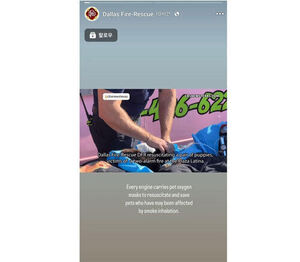대연정(grand coalition)이란 의회에 진출한 주요 정당 여럿이 연합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원내 과반을 겨우 넘기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의원 정원의 70∼80%에 이르는 압도적 다수가 지지하는 연립정부가 들어설 때 대연정이라고 한다. 이 용어가 가장 널리 쓰이는 나라는 아마도 독일일 것이다. 독일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양대 정당은 보수 성향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진보 성향 사회민주당(SPD)이다. 선거 때마다 CDU/CSU 연합과 SPD 간에 1당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이 벌어진다. 그런데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만 같은 두 정당이 드물게 서로 손을 잡고 연정을 꾸리기도 한다. 독일에선 이렇게 원내 1·2당이 힘을 합쳐 압도적 다수 의원의 지지를 받는 정부를 만들 때 대연정이라고 부른다.

지금으로부터 꼭 35년 전인 1990년 1월4일 국내 어느 일간지 1면에 ‘여야가 대연정을 모색한다’라는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당시 국회는 노태우 대통령을 총재로 하는 여당 민정당(125석)과 김대중(DJ) 총재의 평민당(70석), 김영삼(YS) 총재의 민주당(59석), 김종필(JP) 총재의 공화당(35석) 3개 야당이 병존하는 4당 체제였다. 여당이 원내 1당이긴 하나 전체 의석 299석의 과반(150석 이상)에 못 미치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였다. 기사 내용의 핵심은 ‘여소야대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민정당이 야당인 평민당과의 대연정 구성을 검토 중’이란 것이었다. 1980년 전두환·노태우 신군부에 의해 죽음 직전의 위기까지 내몰린 DJ가 군부 독재의 후예라고 할 민정당과 손을 잡는다? 얼핏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실은 민정당과 민주당, 또 민정당과 공화당 간에 합당을 전제로 한 물밑 협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당시 YS와 JP는 각각 제2, 제3야당의 대표로서 제1야당을 이끄는 DJ에 가려 정치권에서 존재감이 확 줄어든 상태였다. 노 대통령 입장에선 YS와 JP를 끌어들여 거대 여당을 만든다는 것은 구미가 당기는 일이었다. 정부가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 통과에서 애를 먹는 여소야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거에 정국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은 YS와 JP는 물론 DJ와의 연대도 염두에 두었던 듯하다. 성사만 되면 한국 정치에서 야당이란 존재가 아예 사라질 판이었다. 하지만 민정당 내 군부 출신 인사가 DJ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YS와 JP 역시 ‘DJ와는 함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노 대통령도 4당 연합의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0년 1월22일 노 대통령과 YS, JP는 청와대에서 회동한 뒤 민정·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을 전격 선언했다. 이로써 도합 219석으로 원내 과반을 훌쩍 넘긴 거대 여당 민주자유당(민자당)이 탄생하며 여소야대 정국은 끝났다. 합당에서 배제된 평민당은 제1야당에서 졸지에 70석에 불과한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다. 3당 합당은 ‘여대야소 복원을 위해 국민이 총선으로 만든 여소야대 구도를 허문 배신의 정치’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3당 합당 이후 치러진 1992년 총선에서 민자당이 149석으로 원내 과반 확보에 실패한 점만 봐도 민심이 차갑게 돌아섰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의 해악이 극에 달한 요즘 정치사를 회고하니 3당 합당이 정국 혼란을 막는 데 상당히 효과적인 대안이었음을 깨닫는다. 마침 오는 22일이면 3당 합당 35주년이 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8/128/20250108522856.jpg
)
![[세계포럼] 국정 공백 속 책임 내던진 다수당](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9/06/30/128/20190630508230.jpg
)
![[세계타워] 실손보험, 사회 안전망 역할 유지해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8/07/128/20240807524904.jpg
)
![[기고] 우리 안의 분열을 넘어서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8/128/2025010852275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