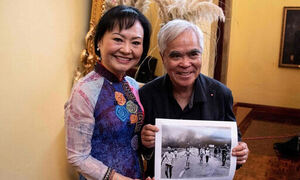흔히 ‘펜타곤’으로 부르는 미국 국방부(DoD)는 1947년 창설됐다. 그 전엔 육군과 공군은 전쟁부, 해군과 해병대는 해군부에 속해 있었다. 2차 대전을 치르면서 지휘 혼선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냉전 대응을 위한 일관된 군사전략 수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각 군을 통할하는 국방부가 생겨났다. 이때 국방장관은 민간인에 맡기는 ‘문민통제’ 조항이 국방부 창설 근거법인 ‘국가안전보장법’에 명문화됐다. 미국 연방헌법의 주권재민 원칙에 따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을 부여하고 민간인이 군부를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법은 군 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하려면 전역한 지 10년(이후 7년으로 단축)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6·25전쟁 발발 직후 조지 마셜 전 육군 참모총장이 의회의 첫 특별 면제 조치로 국방장관에 임명되는 등 소수의 예외가 있었지만, 민간인 국방장관이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독일과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이란 역사적 부채 속에서 민간인 국방장관 관행이 뿌리내렸다. 영국도 군의 민간 통제 원칙을 중시한다. 세 나라 모두 정치인이 장관을 겸임하는 내각제 국가의 특성상 정치인 출신 국방장관이 다수다.
우리나라에선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김용현 전 장관까지 47명의 국방장관이 배출됐는데 민간인 출신은 5명에 불과하다. 최초의 민간인 출신은 영국 상선 선장 출신인 제2대 신성모 국방장관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그를 ‘캡틴 신’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신성모의 후임인 이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 이기붕, 정치인 출신 김용우·현석호·권중돈을 끝으로 민간인 국방장관은 멸종됐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엔 예비역 장성 출신만 국방장관에 임명됐다.
노무현정부는 ‘군 문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인 국방장관 방안을 검토했지만, 군의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당시 남재준 육참총장은 노무현정부의 군 문민화 정책에 반대하다 눈 밖에 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국방부 장관을 민간인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대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합작한 비상계엄 사태로 민간인 국방장관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이 희석된 것일까.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민간인 국방장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7/128/20250527517817.jpg
)
![[데스크의 눈] ‘부정선거’라는 망상](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4/06/128/20220406518006.jpg
)
![[오늘의시선] 우려스러운 주한미군 감축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0/07/21/128/20200721523147.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고양이 집사는 아니지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5/27/128/202505275177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