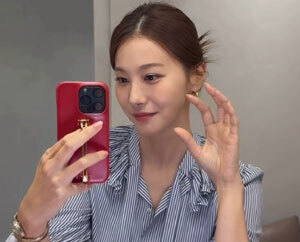물질 가르쳐 주고
전복·소라 나누고…
바다와 더불어 사는 법 지켜와
열아홉 해녀는 50년 흘러
어느덧 ‘대장’ 해녀로…
“바다는 두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집”

아침 햇살이 수면을 금빛으로 물들이는 순간, 중문 앞바다는 고요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해녀들은 고무잠수복과 망사리를 꼼꼼히 점검하고, 물안경을 고쳐 쓰며 바닷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 해녀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자 바다 위로 “후우우―휙” 하는 긴 숨비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다. 이어서 다른 해녀들의 숨비가 연이어 터져 나오며 바다는 생생한 삶의 리듬으로 가득 찼다.






69세 강옥래 중문해녀회장은 오늘도 맨 앞에서 동료들을 이끌었다. 19살에 해녀로 첫발을 내디뎠던 그는 바다에서 살아남는 기술뿐 아니라 동료를 배려하는 법도 익혔다.
“처음엔 얕은 곳에서 성게나 미역을 따며 몸을 익히지. 몇 해 지나면 중군이 되어 10m 정도를 오가고, 더 깊은 바다에서 전복을 따는 건 상군의 몫이야. 하지만 상군은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우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거든.”











강 회장은 상군의 배려를 떠올리며 말했다.
“잡은 전복이나 큰 소라는 힘든 동료에게 나눠주고, 위험한 곳에 들어갈 때는 방법을 알려주며 서로 살피지. 중군이 해야 할 일, 하군이 익혀야 할 자리까지 챙기면서 공동체를 지키는 거야. 바다는 혼자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
5년 차 막내 김도연(34)씨는 바다가 좋아 제주로 왔다. 해녀학교에서 기본을 배우고, 중문 앞바다에서 인턴 해녀로 경험을 쌓은 뒤, 현재는 수협에 등록된 정식 해녀로 활동하고 있다.





“바다가 좋아 제주에 왔어요. 해녀학교를 거쳐 중문에서 인턴 생활을 하며 바다와 물질을 배웠고, 이제는 정식 해녀가 되었습니다. 선배들이 잡은 전복을 나눠주시고 위험한 곳도 알려주셔서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중문해녀는 한때 15명이었지만, 현재는 7명만 남았다. 고령화와 후계자 부족이 가장 큰 이유다. 강 회장은 “예전에는 여러 명이 함께 물질하며 잡은 것을 나누는 풍경이 자연스러웠지만, 지금은 남은 해녀들이 서로의 안전과 삶을 챙기며 바다에 나서는 모습만 남았다”고 말했다.





남은 해녀들의 숨비는 여전히 바다를 울린다. 상군이 잡은 큰 해산물을 중군이 나누고, 하군은 배우며 서로를 지켜주는 호흡 속에서 공동체 정신이 이어진다. 해녀 수 감소는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제주 해녀 문화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 세대를 이어온 공동체와 바다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 문화는 단순한 생업이 아니라, 바다와 인간, 세대를 이어주는 공동체 정신과 생태적 지혜를 담고 있다. 남은 해녀들의 숨비는 오늘도 바다를 울리며, 이 전통을 지키는 살아 있는 증거가 된다.




“바다는 두렵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다.”
아침 바다에 울려 퍼지는 해녀들의 숨비는 단순한 호흡이 아니다. 그것은 삶과 세대 그리고 공동체를 이어가는 제주 해녀의 맥박이며, 중문해녀들의 바다는 오늘도 살아 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中 관광객 운전 허용’ 우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3/128/20251023519878.jpg
)
![[기자가만난세상] 대사관 역할 아직 끝나지 않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3/128/20251023519838.jpg
)
![[세계와우리] 한·미 산업 재균형도 중요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3/128/20251023519869.jpg
)
![[기후의 미래] 진화하는 전쟁의 기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0/23/128/20251023519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