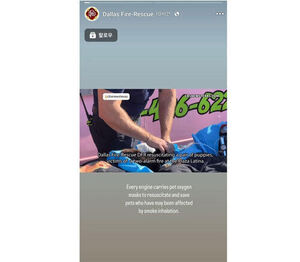30일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름 방제작업을 하던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주민 이모(48)씨는 마치 자기 자식을 찾은 것처럼 침통한 표정으로 말끝을 흐렸다.
사고해역에서 1.5km 남짓 떨어진 동거차도는 세월호에서 나온 기름으로 미역 양식장 등이 큰 피해를 본 곳이다.
사고 당일 구조작업에 이어 수일째 방제작업에 나섰던 이씨는 이날 거센 물살에 맥없이 흔들리는 오일펜스를 바로잡기 위해 닻을 들어올렸다.
수심 30m는 족히 되는 깊이에 박혀있는 닻이기 하지만 왠지 무겁다는 느낌이 손에 전해졌다.
닻줄을 잡고 한참을 끌어올린 A씨 눈에 어슴푸레 들어온 것은 하얀 천.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면서 쏘아올린 조명탄 낙하산이었다.
이씨는 낙하산 줄을 다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까 싶어 그대로 끊어 버리기 위해 적당한 도구를 찾았다.
그때 옆에서 함께 작업을 하던 외삼촌(63)의 말이 들렸다.
"이왕 들어 올린 것, 끝까지 올려보소."
몇 미터를 더 들어 올렸을까. 이씨의 눈에 무슨 물체가 들어왔다. 구명조끼를 입은 시신이 조명탄 낙하산 줄에 감긴 채 올라온 것. 낙하산 줄은 바닥에 꽂혔던 닻에 둘둘 감겨 있었다.
이씨는 "순간 내가 줄을 잘랐으면 이 시신은 영원히 가족을 찾지 못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순간 몸이 움찔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낙하산 줄에 시신이 걸린 것도, 낙하산 줄이 닻줄에 걸린 것도 모두 가족을 만나야겠다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서 숙연해졌다"고 말했다.
사고해역은 지난 실종자 구조·수색기간 하루에도 수백발의 조명탄이 쏟아졌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멕시코만(灣)을 미국만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747.jpg
)
![[기자가만난세상] 전통예술 생태계 사라지게 둘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09/128/20170709507884.jpg
)
![[삶과문화] 총알은 틀림없이 발사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568.jpg
)
![[맹수진의시네마포커스] 애니멀 킹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6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