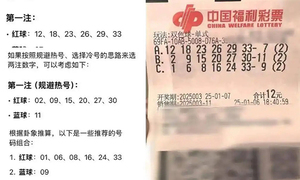사업가인 A(17)양의 아버지 B씨는 10여년 전부터 아내가 출근하면 딸에게 과자와 장난감을 사주며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곤 했다.
A양은 자신이 6살 때 시작된 아버지의 이 같은 행동에 세상 모든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애정 표현인 줄로 알고 친숙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3년 전 중학생이 돼 난생 처음 받아 본 성교육 수업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가 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결국 B씨는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할머니와 고모는 날마다 A양을 찾아 와 “제 아비를 잡아먹은 년”이라고 폭언을 퍼부었다. A양은 마지못해 ‘아버지를 용서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감경 사유를 들어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얼마 후 수척해진 얼굴로 구치소에서 돌아온 아버지의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A양은 집에서 지낼 일이 암담했지만 ‘보호시설’로 가고 싶지도 않았다.

이같이 부모 등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아동·청소년의 대다수가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 현장'에서 가해자와 함께 생활을 이어가는 예도 있다. 재범이 우려되는 측면이다. 정부가 가·피해자 분리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마련했으나, 여러 사정을 이유로 입소자가 시설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
30일 여성가족부 ‘성폭력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친족 성폭력 피해를 상담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은 총 387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가해자가 부모나 형제자매인 경우가 1803명, 친인척은 2072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입건된 친족 성폭력 사범만도 650명이었다.
친족 성폭력은 특성상 가정집 등 가·피해자가 함께 사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난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중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는 161명에 그쳤다. 이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피해상담 과정 등에서 가족들의 회유와 협박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낯선 환경에 새로 적응하는 것을 꺼리면서 보호시설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나 경찰 측은 “시설 입소 여부는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해 본인이 거부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악순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운 데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른 가족의 회유와 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피해 사실이나 처벌 의지마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되고 피해자는 다시 악몽과도 같은 삶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 우경희 부소장은 “아동·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젤렌스키는 독재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0/128/20250220522470.jpg
)
![[기자가만난세상] 불편한(?) 지진 재난문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3/128/20250213519395.jpg
)
![[세계와우리] 트럼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21/128/20240321519850.jpg
)
![[강영숙의이매진] 미술관이 학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06/128/202502065202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