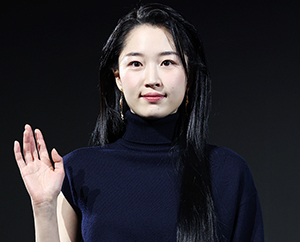배꼽이 없는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는 말한다. 너에게 배꼽이 없는 건 네가 자궁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심해의 어둠 속에서 눈이 필요 없는 물고기로 진화한 ‘블라인드 케이브 카라신’을 수조에 키우는 남자는 그 어항 속에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그 여자의 유해를 뿌렸다. 눈먼 물고기가 흔적만 있는 눈으로 수조를 부유하는 여자의 몸을 드나든다. 진연주(49) 연작소설 ‘이 방에 어떤 생이 다녀갔다’(문학실험실)에 수록된 세 번째 단편 ‘눈먼 방’ 이야기다.
산문 문장이라기보다는 시에 가까운 정제된 문체로 이어지는 5편의 ‘방’ 이야기 묶음이다. 첫머리에 배치한 ‘방’은 2008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이다. 방이 자고 나면 커진다. 방이 커지는 것인지 그 방에 거주하는 이의 가슴이 졸아드는 것인지 판단하는 건 읽는 이의 몫이다. 전화번호는 하나같이 오래된 것들뿐인데 그나마 소통하는 이의 전화기는 꺼져 있다. 그 방의 사람은 울면서 묻는다. “방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당신은 방이 자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검은 방’에는 스스로 어두운 방에 갇혀 자신에게 벌을 주는 이가 있다. 그이는 말한다. “살아 있다는, 그 어떤 기미나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걸 보면 나는 죽은 것이 분명하다. 죽은 채로, 죽지도 못하고, 삶과 죽음 사이에 오도 가도 못하고 붙들려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면서, 나는 죽은 채로 살아 있고 산 채로 죽어 있다.”
‘허공의 방’은 “관계라는, 난폭한 고독과 짓눌린 침묵을 완화시켜주리라는 혹은 그것에서 우리를 구제해줄 것이라는 환영에 불과한, 관계라는 위협으로부터 격리된 공간”이다. 이어지는 마지막 이야기는 ‘이 방에 어떤 생이 다녀갔다’이다. 진연주는 “그녀의 소설은 자살하기와 같다”면서 “아름다운 것들의 유배지,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다움을 해치는 것들 사이에 멈춰 있다. …너무 작아서, 때로는 너무 거대해서, 아름다운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녀의 소설도 그렇다”고 작가의 말에 썼다.
조용호 문학전문기자 jho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연명 의료 중단 인센티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128/20251217518575.jpg
)
![[세계타워] 같은 천막인데 결과는 달랐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128/20251217518533.jpg
)
![[세계포럼]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라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0/128/20250910520139.jpg
)
![[열린마당] 새해 K바이오 도약을 기대하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7/128/2025121751835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