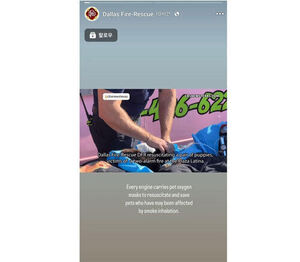리들리 스코트 감독이 연출한 ‘나폴레옹’이 개봉되기 전에 한국에서 내가 본 나폴레옹 관련 영화는 대체로 텔레비전에서 한국어로 더빙된 작품들이었다. 데지레라는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미국영화 ‘데지레’(1954), 나폴레옹의 일생을 연대기식으로 구성한 프랑스 영화 ‘나폴레옹’(1955), 그리고 소련과 이탈리아 합작영화 ‘워털루’(1970)이다.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아벨 강스가 연출한 동명의 프랑스 무성영화(1927)도 있다. 극장에서든 텔레비전에서든 프랑스어로 된 ‘나폴레옹’을 본 적은 없다. 그런 면에서 나폴레옹을 다룬 영화들을 모아서 예술영화전용관에서 상영하면 좋겠다.
할리우드는 재미있는 소재면 그 소재의 국적을 가리지 않고 영화로 만들지만 1차적으로 미국시장을 염두에 두기에 영어 대사로 된 작품들을 만든다. ‘삼총사’, ‘몬테크리스토 백작’, ‘안나 카레니나’, ‘글래디에이터’나 ‘알렉산더’, ‘뮬란’도 그랬다. 그 작품들이 원래 쓰여진 작품들의 언어로 된 영화는 언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들이나 인물들이 할리우드에서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영어 대사로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이 든다. 언젠가는 영어대사로 된 이순신 영화가 전 세계에 배급될 수도 있다.
이번에 개봉한 작품은 나폴레옹과 그의 아내 조세핀의 관계를 중심축으로 설정하고 그의 경력에서 주요했던 사건들인 툴롱항의 승리, 왕당파의 봉기 진압, 통령과 황제로 등극, 아우스테를리츠 전투, 그리고 러시아 원정, 엘바섬 탈출, 워털루 전투,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배치했다. 특이한 점은 역사로서 프랑스혁명의 가장 극적인 장면은 루이 16세의 처형일 텐데 영화는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되는 장면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왕의 죽음으로 시작하면 영화는 실질적으로 누가 최고 권력자가 되느냐라는 이야기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작으로는 ‘서울의 봄’이 그랬다. 그런데 여왕의 죽음, 여성의 부재로 시작하는 이 영화에서는 조세핀이 그 비어있는 여성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전 작품들은 나폴레옹이 권력욕에 사로잡혔거나 야심이 있는 인물, 탁월한 장군, 프랑스의 영광을 체화한 인물로 그리지만, 이 작품은 나폴레옹이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 주도면밀한 인물이 아니라 우물쭈물하면서 조세핀에 집착하는 측면을 부각시켰다. 엄청난 성과를 거둔 사람의 불안한 성격을 그렇게 보여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멕시코만(灣)을 미국만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747.jpg
)
![[기자가만난세상] 전통예술 생태계 사라지게 둘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09/128/20170709507884.jpg
)
![[삶과문화] 총알은 틀림없이 발사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568.jpg
)
![[맹수진의시네마포커스] 애니멀 킹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6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