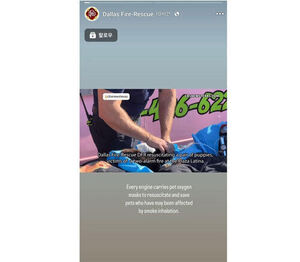동네 서점에 들렀다가 낯익은 책이 매대에 놓인 것을 보았다. 집에 두 권이나 있는 책인데도 반가워 얼른 펴보았다. 자그마치 324쇄였다. 어쩐지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한 권 샀다. 집으로 돌아와 확인해보니 전부터 갖고 있었던 책들은 44쇄와 66쇄였다.
44쇄는 고등학생 때 학교 앞 서점에서 산 책이다. 그것을 읽고 나는 세상에 이런 소설도 있구나, 이런 삶도 있구나, 하며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당시 열렬히 좋아했던 아이돌 가수와 이 책의 작가가 동시에 사인회를 한다면 망설임 없이 작가를 만나러 가겠다고 비장하게 결심했을 정도였다.
그로부터 십여 년 후, 사인회는 아니었지만 나는 운 좋게도 작가 선생님을 실제로 뵈었다. 아니, 운이 좋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선생님은 그때 이미 건강 문제로 자택에 칩거하다시피 지내셨다. 각계각층에서 만남을 청해오는데 모두 고사하고 있다고 스스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일개 조무래기 신인 작가일 뿐인 나를 만나주셨다. 독대로, 그것도 선생님 댁에서 말이다.
그날 선생님이 선물로 주신 사인본이 66쇄다. 너무 황송하고 너무 떨려 나는 내내 얼떨떨한 상태였다. 하여 그날의 기억이 전체적으로 희미하다. 다만 저녁 식사 후 공원을 산책하다가 커피 자판기 앞에서 선생님이 백원짜리 동전 두 개를 꺼내셨던 장면만은 선명하다. 단돈 백원으로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니 얼마나 좋으냐며 선생님은 천진하게 웃으셨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소설이란 어떤 것인지 들려주셨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마지막 말씀만 빼고. 선생님은 문득 떠오른 듯 무심히, 그러나 단호하게 덧붙이셨다. 소설보다 삶이 먼저지요. 삶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잊을까. 그 문장 앞에 하등 부끄러울 것 없는 삶을 사신 선생님의 말씀을. 그리고 소설도 삶도 하나같이 엉망인 나를 변호하지 못해 막막했던, 그럼에도 평생 마음에 새길 진언을 얻었으니 뿌듯하기도 했던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의 심정을.
44쇄와 66쇄 옆에 324쇄를 꽂는다. 세 권 사이에 삼십 년 세월이 흘렀다. 그래도 여전히 소설 쓰기는 어렵고 삶은 더 어려우니 나는 아직도 그 지하철 안에 있나 보다.
김미월 소설가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멕시코만(灣)을 미국만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747.jpg
)
![[기자가만난세상] 전통예술 생태계 사라지게 둘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09/128/20170709507884.jpg
)
![[삶과문화] 총알은 틀림없이 발사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568.jpg
)
![[맹수진의시네마포커스] 애니멀 킹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6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