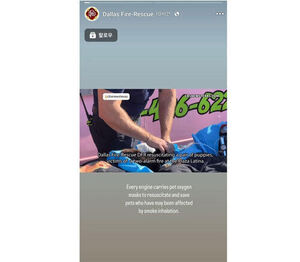부동산은 심리다. 그 심리를 움직이는 건 정책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될까. 요즘 우리 부동산 시장과 가계 대출 상황을 보면 답이 보인다.
올 상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27조원가량 늘어나며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주택구입)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가계부채 급증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정책 대출은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는다.

지난 4, 5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중 정책금융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비중은 70%에 육박했다. 최저 금리가 연 1%대인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시 5개월도 안 돼 6조원의 신청이 몰렸는데, 정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하며 최근 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서민용 저리 주택담보대출을 쏟아내는데,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을 집합시켜 가계대출을 관리하라고 채근한 것도 모자라 DSR 규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며 현장점검까지 나섰다. 당국의 엄포에 시중은행들은 지난 15일부터 앞다퉈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금융채 시중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가면서 대출 금리는 생각만큼 오르지 않았다. 앞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한국은행에 공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리라고 압박하면서 금리인하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서다.
한은에는 기준금리를 내리라면서 시중은행에는 대출금리를 올리라니 “좌회전과 우회전을 동시에 하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자아분열적인 정책의 목적지는 대체 어디일까.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올려도 시장금리가 내려가니 일주일 지나면 다시 금리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서 “대출수요가 늘어나면 원래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금리를 내리는데, 지금은 당국 성화에 못 이기는 척 너도나도 금리를 올리니 오히려 은행 이자마진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려봤자 은행 좋은 일만 시킬 뿐 피해는 소비자 몫이라는 얘기다. 집값은 계속 뛰는데 대출 한도는 줄고 이자 부담은 늘어나서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DSR 규제 시행(7월1일)을 돌연 두 달 연기하면서 ‘막차 타기’ 심리에 방아쇠를 당겼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추가로 부과해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규제가 시작되는 9월 전 대출받으려는 수요자가 몰리면서 이달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25일까지 5조2589억원 늘었다.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당국의 설명만으론 시행 불과 6일 전에 나온 전격 연기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 집값 떨어지면 지지율이 하락하니 정부가 어렵게 살아난 부동산 경기 냉각을 우려해 DSR 2단계 시행을 연기한 것이라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린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충수였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투기 수요 발생을 막기 위해 조속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주문했다. 어떤 대책을 내놓든 좌우 깜빡이를 동시에 켜거나, 브레이크 대신 액셀러레이터를 밟아놓고 급발진을 주장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멕시코만(灣)을 미국만으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747.jpg
)
![[기자가만난세상] 전통예술 생태계 사라지게 둘건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7/09/128/20170709507884.jpg
)
![[삶과문화] 총알은 틀림없이 발사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568.jpg
)
![[맹수진의시네마포커스] 애니멀 킹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09/128/202501095246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