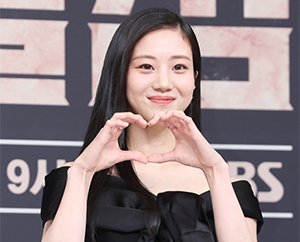검찰은 청와대 직원 등이 채 전 총장 뒷조사를 한 사실은 확인했다. 뒷조사는 당시 채 총장 취임 69일 만인 지난해 6월11일에 이뤄졌고, 이 과정에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과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송모 국정원 정보관이 개입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본인 업무와 상관없는 검찰총장 뒷조사를 벌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윗선’의 지시나 개입 없이 이들이 독단적으로 채군 가족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더 이상 이 부분을 수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보니 채 전 총장 뒷조사를 벌이게 된 배후 규명은 사실상 영구미제로 남을 전망이다.
미심쩍은 것은 당시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채 전 총장 내연녀 임모(55)씨가 부인 행세를 하며 금품을 수수한다는 의혹을 감찰했다. 그런데 검찰이 확인한 바로는 당시 민정수석실은 채군이 채 전 총장 혼외아들이 맞는지 여부만 집중 감찰했을 뿐 금전거래 내역과 관련된 조사는 없었다. 민정수석실 감찰활동이 정상적 직무범위에서 벗어난 민간인 불법사찰로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은 그러나 이 부분 역시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채 전 총장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한 데 대해 정치적 보복을 당한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채 전 총장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고교동창 이모(57)씨 활동도 여전히 의심을 남기고 있다. 검찰은 삼성계열사 임원이던 이씨가 회사 돈 17억원을 횡령해 이 중 상당액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쓰고 일부는 채 전 총장 내연녀에 건넸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씨의 횡령 사실은 회사 퇴직 후 한참 뒤에 드러났다는 점에서 삼성 측이 범죄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정황은 여전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삼성 측이 채 전 총장을 간접 후원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못을 박고 있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마윈의 복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3/128/20250223510434.jpg
)
![[특파원리포트] 케네디센터 코드인사 논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2/128/20250112515508.jpg
)
![[김정식칼럼] 내수 살리기 총력전 펼쳐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9/128/20250119516487.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멀고 험난한 ‘유종지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1/12/128/20250112515496.jpg
)